청담동 한복판…오롯이 책과 나만 존재하는 흰 소설의 숲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페이스 오디세이
서울 청담동 '소전서림'
삼면 꽉 채운 책의 바다
세상과 완전 분리된 느낌
몸에 꼭 맞는 의자 골라
책에만 몰입할 수 있어
서울 청담동 '소전서림'
삼면 꽉 채운 책의 바다
세상과 완전 분리된 느낌
몸에 꼭 맞는 의자 골라
책에만 몰입할 수 있어

“이 조그만 책을 열어본 후, 겨우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해 나의 방에까지 한걸음에 달려가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책을 읽기에 좋은 공간이란 무엇일까. 책에 온전하게 몰입하기 위해 카뮈에게 필요한 공간이 아무도 없는 자신의 방이었다면 이 소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책에 몰입할 수 있을까. 그 답의 실마리를 ‘소전서림’에서 찾아봤다.
소전서림은 흰 벽돌로 둘러싸인 책의 숲이라는 뜻으로 예술·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서적을 중심으로 편성된 서가가 있는 멤버십 도서관이다. 이곳에서는 책에 몰입하는 과정이 공간을 경험하는 단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그 시작은 입구다. 건물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둑어둑하고 완만한 곡선을 따라 이어진 긴 계단을 한 번 내려오고, 벽과 책장 사이 좁은 길에 나 있는 긴 계단을 한 번 더 내려와야 한다. 이런 전이 공간을 지나야 바깥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책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
이어지는 공간에 들어서면 삼면이 책으로 꽉 차 있는 서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벽을 따라 선 책장이 형성하는 격자 패턴, 그 안을 꽉 채운 책들, 그리고 책장의 패턴이 공간의 상부까지 연장된다. 종이창과도 같은 면을 통해 쏟아지는 은은한 빛에 서가는 정말로 책의 숲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잡지, 철학, 시, 북아트 전시 연계 도서를 담고 있는 이 중앙서가를 기준으로 한편에는 서가이자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기도 한 예담이, 다른 한편에는 1인 서가가 자리하고 있다.
예담은 예술분야 서적과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도록을 모아둔 전시 서가이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열린 공간이다.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1인 서가는 낮은 칸막이로 나뉜 작은 공간들이 벽을 따라 이어진다. 온전히 책과 자신만 존재하는 작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예담과 1인 서가는 복층으로 구성돼 있다. 좁은 길과 같은 이 서가를 따라 걷다 보면 역사, 과학뿐 아니라 장르문학도 만날 수 있다. 이 길 또한 잠시 멈춰 책을 읽어도 좋은 또 다른 서가가 된다. 머무르는 공간과 이동하는 길이 분리돼 보이지만 책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결국 모든 곳이 책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소전서림에서 저절로 눈이 가는 것은 가구, 그중에서도 의자다. 서가마다 다른 의자는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 이는 연출을 넘어 책 읽는 사람의 경험을 생각해 계획한 것이다. 테이블과 함께 배치되는 곳에는 아르텍의 단정한 목재 의자가, 열린 공간인 예담에는 더욱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핀율의 의자가, 1인 서가의 칸막이 내부에는 LC4라운지체어처럼 자세를 한껏 풀고 머물 수 있는 의자가 있다. 중앙서가 한편에는 FK6720이 배치돼 각 공간에 적합한 기능과 분위기를 충족시킨다. 책을 읽을 때 의자가 중요한 이유는 앉는 행위를 넘어 읽는 자세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 자세는 다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소전서림에서 마음에 드는 의자를 고르는 일은 책을 대하는 마음을 결정짓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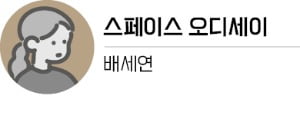
배세연 한양대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