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처럼 되살아난 세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황지원의 프리마 돈나

그런데 유독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화재가 잦았다. 모두 세 번에 걸쳐 큰불이 났는데, 특히 1996년에 일어난 화재가 끔찍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라 페니체를 대리석 기둥 몇 개만 남기고는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다. 극장의 보수공사를 도맡은 업자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되자 위기를 모면하고자 일부러 불을 낸 것이다. 전기설비 정도만 고장 내려던 그들의 의도는 빗나갔다. 극장은 대리석 기둥만 남기고 모두 잿더미로 변했고, 전 세계에서 통곡에 가까운 탄식이 쏟아졌다. 그 자체로 예술작품인 극장이었다.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후의 오페라 하우스 복원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전체 골격이나 구조는 남아 있는 청사진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다지만, 극장 내부의 그 호화롭고도 섬세한 미술품과 화려한 인테리어 등은 쉽지 않았다. 이때 뜻밖의 작품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탈리아의 영화 거장 루키노 비스콘티의 1954년 작 ‘센소’였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새 극장을 짓자는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라 페니체’는 단순히 하나의 공연장을 넘어, 베네치아의 영혼이요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했다. 베네치아 시 당국은 결연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들의 복원 철학은 짧지만 명확하다. ‘코메라, 도베라’(Com’era, Dov’era). 즉,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짓겠다는 것. 복원은 느렸지만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8년간의 작업을 거쳐 2004년 다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뒤 몇 번을 찾아가 ‘라 트라비아타’를 보았다. 극장의 내·외관이 옛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되살아나 있었다. 더욱 경이로운 건 과거의 라 페니체가 지녔던 그 특유의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마저도 그대로 복원됐다는 점이다. 새로 연 극장 특유의 들뜨고 번쩍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한 기품 있는 향취가 극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서린 어떤 예술적인 기억까지도 복원해낸 듯했다. 비올레타의 찬란한 아리아만큼이나 라 페니체 극장 또한 영원성을 지닌 위대한 예술 작품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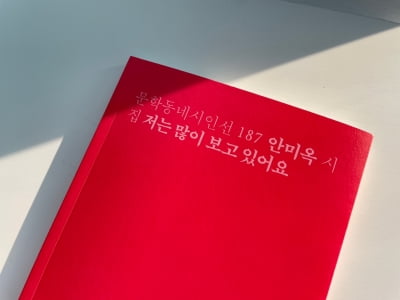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