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우디 제치고 중국의 제1 원유수입국 등극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러, EU·서방 제재에 아시아 원유시장에 눈길 돌려
중국 원유 점유율 8.8→14%, 인도 3→40%로 확대
中 경제회복 및 유가 상승에 대비해 비축량 늘리고
인도, 제재받는 러시아 대신 EU에 정유 제품 팔아
사우디, 떨어진 감산 효과에 OPEC 지위도 '흔들'
중국 원유 점유율 8.8→14%, 인도 3→40%로 확대
中 경제회복 및 유가 상승에 대비해 비축량 늘리고
인도, 제재받는 러시아 대신 EU에 정유 제품 팔아
사우디, 떨어진 감산 효과에 OPEC 지위도 '흔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사우디를 추월하기 직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뒤집힌 세계 원유시장에서 사우디의 영향력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데이터 제공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중국 석유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쟁 전 8.8%에서 최근 14%까지 늘었다. 반면 사우디 비중은 지난 3개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14.5%까지 하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대중국 석유수출국 1위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앞으로는 그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인도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최대 석유수출국 지위를 다졌다. 러시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전쟁 전 3%에서 현재 약 40%로 급등했다. 반면 사우디의시장 점유율은 20%에서 13%로 뚝 떨어졌다.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서방이 러시아 원유 가격을 통제하고 나선 결과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배럴 당 60달러로 설정했다. 러시아산 원유는 전쟁 이후 배럴 당 100달러 이상으로 판매되고 지난해 봄에는 한때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EU(유럽연합)은 아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로 눈길을 돌렸다. 전쟁 전 러시아는 우랄산 원유를 주로 발트해와 흑해로 운반해 유럽에 판매했다. 아시아 방면으로는 운송 경로가 길고 인프라가 깔리지 않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동 산유국에 밀렸다. 가격조사기관인 아르거스미디어에 따르면 발트해에서 우랄산 원유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배럴당 6달러로 페르시아만 원유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유 가격을 크게 할인하면서 운송비 차이를 상쇄했다.
중국과 인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가 회복돼 유가가 오를 경우에 대비해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석유데이터분석회사인 리피니티브 에이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하루 평균 177만 배럴의 원유를 재고로 확보했다. 2020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디젤로 가공해 유럽에 팔고 있다. 전쟁 전 러시아가 하던 사업을 가져온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사우디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시장점유율을 빼앗긴 것 뿐만 아니라 OPEC의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달 초 OPEC은 사우디 독자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도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배럴 당 71.74달러에 거래된 미국 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이날 오히려 67.7달러까지 떨어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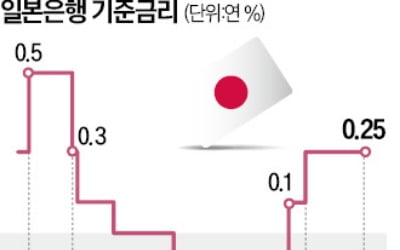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