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비 샌다고 내용증명 보내다 '작가 슬럼프' 벗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17년차 에세이 작가 김신회 인터뷰
지난달 <나의 누수 일지> 출간
지난달 <나의 누수 일지> 출간

허구의 영화나 소설이었으면 좋을 이 이야기의 장르는 에세이다. 17년차 에세이스트 김신회 작가는 작년 여름 누수를 겪으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동안 모든 경험은 삶의 거름이 된다고 믿어왔는데 누수만큼은 예외다. 집에 물이 새면 삶이 줄줄 샌다. 아, 인생이 누수네! 내 인생 자체가 누수됐어!"
최근 누수 체험기를 담은 <나의 누수 일지>를 낸 김 작가를 지난 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는 장맛비가 쏟아졌다. 그와 마주 앉으니 "올 여름엔 천장 누수는 괜찮느냐"는 질문이 절로 나왔다. 김 작가는 "이번 책 낸 뒤에는 독자들이 유난히 안부를 궁금해한다"고 웃었다.
김 작가는 누적 판매량이 40만부에 달하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를 비롯해 <심심과 열심> <여자는 매일 밤 어른이 된다> 등 10권 넘는 책을 썼다.
10여년간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했던 그는 에세이스트가 된 후 1년에 1번꼴로 책을 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책을 내세요?"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글쓰기가 습관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런 그를 코로나19 팬데믹이 멈춰 세웠다. 만남도 이동도 제한된 2년. 일상을 재료 삼아 글을 쓰는 에세이스트에게는 글감 공급망이 무너진 셈이었다. 그 와중에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10년 넘게 쌓아올린 에세이스트의 삶이 위험신호를 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수가 새로운 글쓰기 동력이 됐다. 나중에 윗집에 배상을 요구하려 녹취 남기듯 진행 상황을 기록하면서 다시 매일 글을 쓰는 루틴을 회복했다.
김 작가는 "이번 책은 누수가 제게 준 것 중 최고"라지만 누수 처리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감감무소식인 윗집을 향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문제 처리를 위해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을 들여야 하는 상황은 수시로 안전을 위협받는 1인 여성 가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글쓰는 일의 특별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윗집도 나름의 사정과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는 글을 써내지 않았잖아요. 이건 제 입장에서 전달한 제 이야기죠. '이것도 작가의 특권이구나'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윗집 거주자의 세부 정보 등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각색했다.
이번 책은 여러모로 에세이스트 김신회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매년 5월이면 중쇄를 찍는 그의 에세이 <아무튼, 여름>은 여름에 대한 찬사가 가득한 책이다. 휴양지의 여름밤, 얼음 띄운 칵테일, 휴가 떠난 낯선 나라에서 만난 연인…. 여름날의 매력과 추억이 생동한다.
누수는 여름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그는 이번 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무튼, 여름>이 여름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면, <나의 누수 일지>는 여름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에요."
이번 에세이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이후 그를 수식하던 '힐링' '위로'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 연락 없는 윗집과의 신경전은 독자마저 애끓게 하는데, 베테랑 '글쟁이'의 내공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듯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글이라서 걱정이 많았어요. 작가로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초고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부탁할 정도로요. 외주 편집자에게 '독자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글 아니냐'는 걱정을 내비쳤더니 '독자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글을 쓰는 건 쉽다. 반대를 해내기가 어려운 거다. 이대로 밀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이 도움이 됐어요."
그는 이번 책 감상평 중에서 "책을 중간에 덮을 수 없어서 길을 걸으면서까지 읽었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에세이를 쓰는 것도 제겐 '일'이고 시간이 쌓이면서 '기술'이 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도를 점점 안 하게 돼요. 전업 에세이스트라지만 출판사가 제 글을 찾아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결혼, 출산처럼 남들이 흔히 겪는 인생의 관문들을 거치지 않아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삶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출판을 직접 해보면 뭔가 내 안에 다른 이야기가 쌓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그는 책날개에 이렇게 적었다. "여름사람은 여름의 활기와 뜨거움, 청량함을 전하는 책을 만듭니다. 첫 책 <나의 누수 일지>를 시작으로, 여름을 닮은 다양한 문학작품들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에세이'가 아닌 다른 장르를 향해서도 문을 열어뒀다.
김 작가가 이번 책을 쓰면서 얻은 게 또 하나 있다. 그건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누구도 누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깨달음. 김 작가는 "이번 책은 특이하게도 독자들이 소셜미디어에 후기가 올릴 때 꼭 자신의 누수 경험담이나 누수 사진을 함께 올린다"고 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의 윗집이거나 아랫집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폭우가 쏟아지는 일도 잦아졌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누수는 소리없이 찾아오고 원인조차 알기 힘들다. 혼자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다. 이쯤 되면 누수는 인생의 위기에 대한 은유처럼 읽힌다. 책에 사인을 청하자 그는 이런 문구를 적어내려갔다. "인생엔 누수 없기를, 이라고 말하지만 누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힘내기."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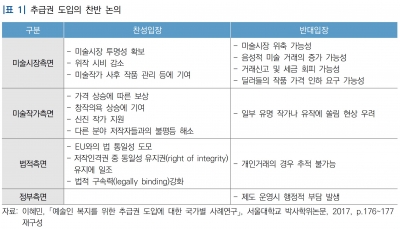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