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대의 맑은 눈으로-흑백의 세상 끝, 빛나는 바다를 보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강희찬의 역사영화-진실과 거짓
영화 '자산어보'
영화 '자산어보'

“이제 보니 형이 더 위험한 인간이오.” 정약전을 천연의 감옥 흑산도로,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보내면서 그들이 주고받은 말이었다. 신유사옥(1801년)이 원했던 건 천주교 박멸이 아니라 정적政敵의 소멸이었다.
비문명의 세계. 하늘과 바다밖에 없는 곳.
흑산이란 이름에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
밤하늘엔 수없이 많은 작은 구멍들이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정약전은 바람에 실린 바다 향을 들이쉬며 버텨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살아만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고 상처는 회복될 수 있다. 살아만 있다면.
그는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었고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섬은 치유의 공간이 되어갔다.
그즈음 그의 눈에 해양생물들이 들어왔고 동시에 하나의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것들의 명칭, 크기, 형태, 생태, 맛, 어획 방법 등을 정리한 어보魚譜를 써보리라.

바다로 나가려는 창대를 그가 붙잡았다. 대역 죄인이라며 그를 피했던 창대는 약전으로부터 글을 배우는 대신 자신이 아는 지식을 풀어놓기로 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 앞에서 나이와 신분의 경계는 사라졌다.
“이것은 거래입니다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창대가 말했다.
정약전은 바다생물들을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본다. 때론 해부를 하면서 대상의 ‘안’까지 탐구하려는 지적인 욕망을 보여준다. 약전은 자신이 이름 붙인 『자산어보』라는 책이 병을 치료하고,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길 원했다. 본래는 그림을 담은 도감圖鑑을 생각했지만 동생의 만류로 글로만 적기로 했다. 일본에선 그림을 통한 지식 전달이 유행이었지만 조선에선 여전히 ‘말씀'과 ‘한자’가 중요했다.

창대는 약전이 어보에 매달리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강진에 있는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관이 해야 할 일과 국가개혁 같은 일에 관심이 있으신데 왜 스승님은 하찮은 물고기 책을 쓰실까.
창대의 물음에 그는 답했다. 지구는 둥글고 서양배는 큰 바다를 제집처럼 돌아다니는데 우린 사서삼경이나 외고 있을 거냐고. 지금도 저들은 무언가를 알아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선과 악을 따지고 사람의 본성을 파고드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사물 공부가 필요한 때라고.
약전은 동생과 달리 희망 고문으로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주자 성리학이 종교적 권위를 갖게 되면서 이 땅엔 지적 자유가 사라졌다. 체제 순응적인 학문은 지체와 쇠퇴를 불러왔다. 그는 낯선 세계를 맞닥뜨리고 싶었다.
세상 끝으로 떠밀렸다고 믿었는데 눈을 떠 보니 빛나는 바다가 보였다.
밀려왔던 시간은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조선에서 문제적 인간이었던 정약전은 어민들, 창대, 아이들 그리고 해양 생물들과 함께 살다 1816년에 죽었다.
2년이 지나 동생은 유배가 풀렸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썼다. 정약용의 제자 이청이 정약전이 남긴 글에 문헌 고증을 덧붙여 자산어보를 완성했다. 책에는 물고기와 해조류를 포함한 해양생물 227종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약전은 오징어 먹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글씨는 매우 윤기가 나다가 종이에서 벗겨져 사라졌지만 바닷물을 만나니 신기하게도 먹빛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망각되는 듯했던 약전은 다시 우리 곁으로 왔다.

약전은 창대의 말을 그대로 기록했다. 강고한 현실의 껍질을 깨고 푸른 날개로 누구든 날아오를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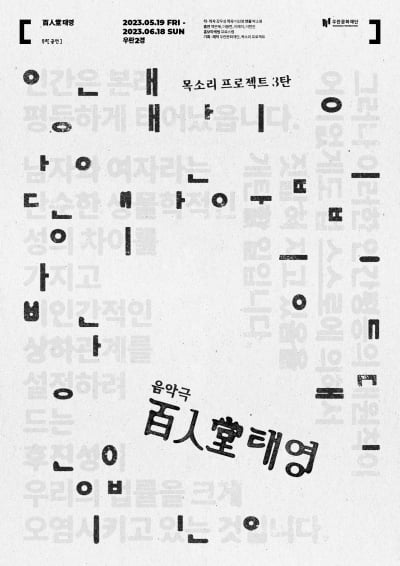
![[고두현의 아침 시편] 아 이젠 안 계시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629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