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톤 김태한 "압박감 짜릿하게 즐긴 경험이 우승보다 소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퀸의 위너'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
아시아 남성으로 첫 금메달 수상
"관객들과 하나 된다는 기분 황홀"
대회 앞두고 프로그램 50번 고쳐
"큰 상 받았지만 신인이라고 생각
세계적인 콩쿠르 계속 도전할 것"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
아시아 남성으로 첫 금메달 수상
"관객들과 하나 된다는 기분 황홀"
대회 앞두고 프로그램 50번 고쳐
"큰 상 받았지만 신인이라고 생각
세계적인 콩쿠르 계속 도전할 것"

‘벼락 스타’란 말은 바리톤 김태한(23·사진)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남자 성악 부문에서 우승하면서 ‘숨은 보석’에서 ‘K클래식’의 주인공이 됐다. ‘클래식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콩쿠르 남성성악 부문에서 아시아인이 금메달을 딴 건 김태한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 서초동 국립오페라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태한은 “큰 상을 받았다고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했다.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 서겠다’는 더 큰 목표가 그대로인 만큼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깜짝 스타’ 같지만, 클래식 음악계는 꽤 오래전부터 김태한을 주목했다. 3~4년 전부터 크고 작은 콩쿠르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지난해 5월 독일 노이에슈팀멘 콩쿠르와 올 1월 비냐스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잇따라 특별상을 받으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점은 지난달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였다. 이 콩쿠르의 최종 후보에 오르면 다음 경연에는 지원할 수 없다. 김태한에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뭔가 ‘승부처가 왔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잘 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프로그램을 50번이나 고친 것 같아요. ‘김태한은 이런 성악가’란 걸 보여주기 위해 곡 순서부터 언어까지 하나하나 전략을 갖고 구성했습니다. 베르디 ‘돈 카를로’의 아리아를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부른 것이 대표적이죠. 벨기에가 프랑스어권이기도 하고 마지막 가사가 ‘플랑드르를 구해주세요’인데, (콩쿠르가 열린) 벨기에가 플랑드르 지역인 점을 감안해 프랑스어로 선곡했습니다.”
결선 무대는 그에게 우승컵과 함께 ‘자신감’이란 큰 선물을 안겨줬다. 벨기에 보자르홀을 꽉 채운 2000여 명의 외국 관객이 주는 ‘압박감’을 짜릿함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과 하나가 된다는 기분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더 경연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우승 직후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페라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 소감이 클래식계에선 화제가 됐다. 김태한은 “말을 하다보니 오페라 스타만 얘기했지만 ‘가곡 스타’도 되고 싶다”며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처럼 가곡을 잘 부르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페라는 이미 있는 캐릭터를 나만의 캐릭터로 승화하는 음악입니다. 반면 가곡은 저의 해석이나 재량에 따라 아예 음악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러니 제가 가곡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요.”
김태한은 자신의 퀸 엘리자베스 우승이 국내에서 오페라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콩쿠르를 통해 성악에 대한 인기가 오른다면 주저하지 않고 또 출전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BBC 카디프 국제 성악 콩쿠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하는 오페랄리아 콩쿠르 등 다른 콩쿠르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로 ‘감동을 주는 성악가’가 되는 것을 꼽았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선화예고 1학년 시절 독일에서의 기억이 그의 목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교 1학년 시절 독일에서 친구들과 연주를 한 경험 덕분에 지금도 성악가로 버티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노래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어요. 독일의 한 작은 홀에서 친구들과 김효근의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렀어요. 한국말로요. 그걸 독일 사람들이 듣더니 몇몇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음악의 힘 아닐까요.”
김태한은 오는 9월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오픈 스튜디오 멤버로 들어간다. 10월에는 한스아이슬러국립음대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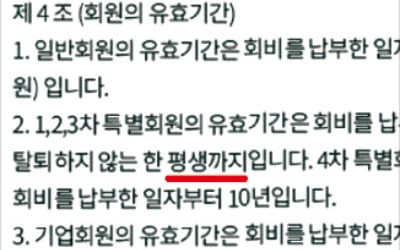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