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클라라도 이해 못한 '새벽의 노래'... 그 끝을 파고든 문지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0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연주하고 있다. 금호문화재단 제공
당연한 얘기지만, '근육을 잘 쓰는 것'은 피아니스트의 기본 역량 중 하나다. 음악의 흐름에 따라 열 손가락과 양 손바닥, 두 팔을 비롯해 온 몸의 근육을 쥐락펴락 해야한다. 이걸 세밀하게 해낼수록 표현은 정교해지고 음은 자연스러워진다.
지난 20일 서울 신촌동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문지영(28) 리사이틀은 '피아니스트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걸 보여준 무대였다. 문지영은 개성있는 해석이나 독보적인 음색를 내세우기 보다는 음악에 대한 진솔한 접근으로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연주자였다. 문지영 특유의 '자연스러움'은 텐션과 릴렉스를 조화롭게 구사하는 기본기에서 나왔다.
그의 강점은 이번 공연 주제인 '목소리'와도 맞아 떨어졌다. 이 공연은 성악 작품을 기악 작품으로 소화해 악기 고유의 목소리를 발견하자는 취지로 금호문화재단이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모차르트의 환상곡과 소나타14번 모두 C단조인 두 곡으로 시작됐다. 모차르트 곡 중 드문 단조곡이다. 문지영은 마치 노래를 흥얼거리듯 강약을 조절하면서 달콤한 모차르트와 격렬한 모차르트를 표현했다.
이어 연주한 쇼팽도 모차르트와 연관된 곡이었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 등장하는 이중창 '우리 손을 맞잡고'를 주제로 한 쇼팽의 변주곡이었다. 이 곡은 지금으로 치면 과거의 명곡을 현대 아티스트가 소화한 '커버곡'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익살맞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쇼팽을 만나 섬려하고 로맨틱한 낭만주의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10대 후반의 어린 쇼팽을 당대의 슈퍼 스타로 만들어 준 작품이다. 쇼팽 특유의 서정성과 화려한 테크닉적 요소는 청중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연주를 마치자 관중석에선 환호가 쏟아졌다.

피아니스트 문지영. 금호문화재단
2부는 음악에 대한 연주자의 진정성과 무게감이 엿보이는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슈만의 '새벽의 노래', 막스 레거의 '바흐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모두 난해하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곡이다.
1853년 10월에 나온 새벽의 노래는 슈만이 죽기 3년 전에 만든 그의 만년 작품 중 하나다.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약 5개월 전, 그러니까 정신적·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다. 슈만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아내인 클라라조차 "독창적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다.
그렇기에 '슈만 스페셜리스트'로 정평이 난 문지영에게도 쉽지 않은 곡이다. 5개 세트로 이뤄진 이 작품은 코랄풍(교회용 찬송가)의 아리송한 화성으로 시작해 정신적 문제를 겪던 슈만의 심연을 파고든다. 문지영은 이 곡을 통해 초월, 절규, 혼란, 그리움 등 극도로 복잡한 슈만의 정신세계를 담으려 애썼다.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그려야 하는 이 곡을 들으니, 문지영에게 '슈만 스페셜리스트'란 별명이 왜 붙었는 지 알 것 같았다.
마지막인 막스 레거의 작품은 바흐에 대한 레거의 절절한 오마주다. 이 곡은 바흐의 칸타타 128번 '오직 그리스도의 승천에 의해서만'에서 가져온 경건한 주제 선율로 시작한다. 바흐의 복잡한 대위법과 후기 낭만주의 음악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이 만나는 30분짜리 대곡이다.
문지영의 레거는 상영시간은 길지만 지루하지 않은 장편영화를 본 느낌이었다. 마지막 음을 마치고 잠시 찾아온 정적에서 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앙코르로 들려준 바흐의 평균율 1번에서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C장조 기본화음으로 진행되는 말간 음악은 후배 레거의 격정적인 오마주에 대한 바흐의 화답으로 들렸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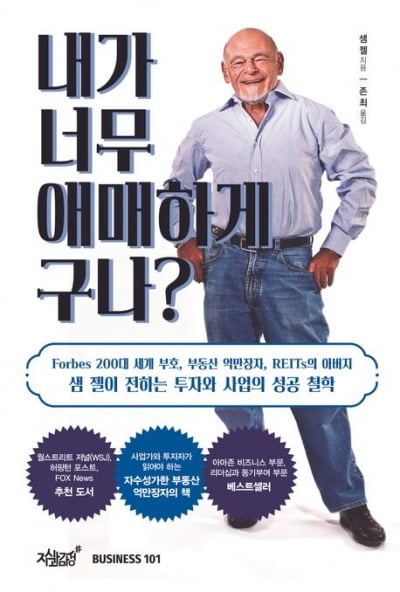
![츠베덴의 서울시향, 디오니소스를 얻고 아폴론을 잃다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311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