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세상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청춘 스케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정대건의 소설처럼 영화읽기

그러나 이러한 과업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외국이라고 다르진 않은 것 같다. <청춘 스케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들어간 사회초년생 레이나(위노나 라이더)가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다. 레이나는 졸업 후에도 돈을 벌 생각 없이 한량처럼 살아가고 있는 친구 트로이(에단 호크)가 거슬린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 여피족인 방송국 부사장 마이클(벤 스틸러)에게 끌린다. 레이나는 방송국에서 꼰대 같은 상사와 갈등을 겪고 해고당한 뒤, 방황한다.
<청춘 스케치>의 영어 제목인 ‘Reality Bites’는 ‘현실은 아프다’ ‘아픈 현실’ 정도로 해석될 것 같다. 주연으로 출연한 벤스틸러가 연출도 겸한 이 작품은 거의 모든 대사가 명대사에 속할 정도로 낭만 가득하고, 티셔츠만 걸쳐도 반짝반짝 빛나는 시절의 위노나 라이더와 에단 호크는 청춘의 아이콘 그 자체다.
이 영화는 쓰린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트로이의 입을 통해 낭만적인 위로를 준다. “난 스물세 살이 되면 뭔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라고 푸념하는 레이나에게 트로이는 “스물세 살에 되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야.”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서른셋에도, 어쩌면 마흔셋에도 유효한 말이 아닐까. 40대 선배들은 내게 ‘흔들리지 않는 나이, 불혹’ 같은 환상은 품지 말라고 충고한다. 40대에도 계속 흔들리고 아플지라도, 사회 초년생 때와 달라진 건 이 세상이 애초에 나의 기대와 다르게 생겨먹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점일 것이다.
극 중 레이나처럼 현실에 아프게 깨물린 이후부터 나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곤 했다.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그런 내 혼잣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럼 세상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빤하고 낯간지러운 표현이라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그리고 가끔은 그게 꼭 필요한 말일 때가 있다. 세상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위로를 건네는 누군가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두컴컴한 터널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현실이 영화처럼 낭만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보석 같은 작품은 적어도 방황하는 건 너뿐만이 아니라는 큰 위안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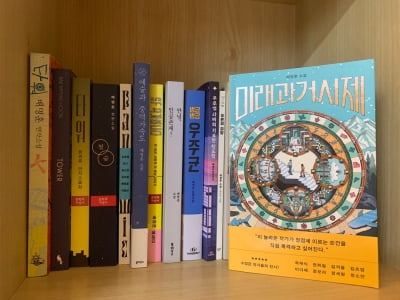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