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노키즈 존' 늘어나자…'반사회적 영업'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간지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조 윌리엄스는 1일(현지시간) 런던 남부 크리스털 팰리스의 펍 '알마'가 최근 10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기로 한 사례를 소개했다. 펍 알마의 업주인 스티븐 보이드는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의) 아주 터무니없는 요구는 없었지만, 물이 든 사과주스를 달라거나 음식을 가열하되 너무 많이 가열하지 말고 버섯, 양파, 소금, 후추를 제거하라는 등 힘든 요구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이)흡연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는 다른 손님을 노려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린이 동반 손님의 입장을 막았다. 보이드는 "어린이 동반한 손님을 안 받았더니 매출이 늘고 분위기도 좋아졌다"며 "낮 근무를 피하려고 애쓰던 직원들이 달라졌고, 종업원들이 자주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하게 됐다"고 만족했다.
잉글랜드 북부 요크의 부티크 레스토랑 '위펫 인'도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주인 마틴 브리지는 "30년간 요식업을 했는데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책임감이 황당할 정도로 바뀌었다"며 "(요즘 부모들은)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전했다. 음식 평론가 마리나 오러플린의 레스토랑의 인터넷 리뷰에는 "직원들이 내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단 2분 동안 아이를 봐주는 것도 거부하고 짜증을 냈다“는 혹평이 게시되기도 했다.
아일랜드의 커피 하우스, 미국 뉴저지의 스파게티 전문점 등에서 어린이 입장 불가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독일에선 '할머니의 부엌'이란 이름의 레스토랑이 14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해 화제가 되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어린이 동반을 금지한 자영업자를 '이기적이며 반사회적인 여성혐오자'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어린이의 부모는 "왜 우리도 아기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처럼 하면 안 되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급 레스토랑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안 되냐"고 불만을 터트린다. 반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쪽에선 "세 살짜리가 펍에서 제대로 행동할 리가 있냐", "나는 옆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 분위기를 즐기려고 비싼 돈을 지불했다"고 반박한다. 이어 "누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칼럼은 "한국에는 451개의 '노키즈존'이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을 '아동 차별'이라고 규정했으나 소용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햄버거 가게에 아기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인지, 아기가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덜 관대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칼럼의 필자 윌리엄스는 "실내 흡연 금지도 시행 초기에는 흡연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엔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담배 냄새를 맡지 않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을 것"이라며 "선택적 어린이 출입 금지도 실내 흡연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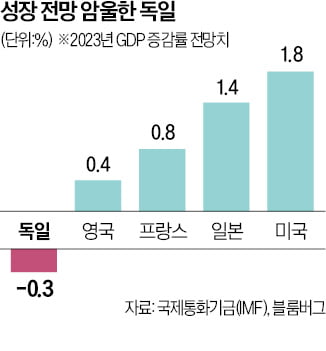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