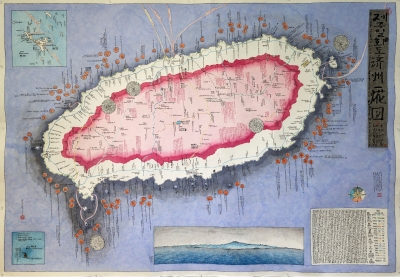고야의 '아들 잡아먹는 아버지', 알고 보면 더 무서운 3대 포인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프란시스코 고야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알고 보면 더 무서운 세 가지 이유
루벤스 동명의 작품은 '또다른 공포' 선사
알고 보면 더 무서운 세 가지 이유
루벤스 동명의 작품은 '또다른 공포' 선사

음울하고 기괴한 색조와 형태는 꿈에 나올까 두려울 정도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더 무섭다. 무더운 여름 밤을 서늘하게 식혀 줄 세 가지 감상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신화 원본보다 무서운 이야기
작품 속 등장하는 괴물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경과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그리스 신화 이름은 크로노스). 신들의 왕이었던 그가 자식을 잡아먹게 된 건 어느날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뒤부터였다.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기 위해 사투르누스는 자신의 아이를 태어나는 족족 집어삼켰다.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런 패륜에 크게 슬퍼하고 반발했다. 그러다 한 명을 간신히 살려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주피터(제우스)였다. 장성한 주피터는 아버지에게 몰래 구토를 유발하는 약을 먹였다. 덕분에 뱃속에 있던 플루토(하데스)와 넵투누스(포세이돈) 등 주피터의 형제자매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주피터가 이들과 함께 싸워 아버지를 무찌르고 신들의 왕좌에 오르는 게 그리스·로마 신화 시작 부분의 얘기다.

② 화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고야가 1819년부터 1823년까지 4년간 은둔 생활을 하며 그린 벽화들 중 하나다. 이 작품을 비롯해 이 시기 고야의 작품은 ‘검은 그림’으로 불린다. 지금은 스페인 프라도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왜 이런 작품을 그렸든간에 이 작품에서 고야의 광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섬뜩한 점이 하나 있다. 심심풀이로 그림이나 만화를 그려봤다면, 한 번쯤은 자기가 그리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릴 때 고야는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③ 정말 무서운 건
신화에서 사투르누스가 자식들을 죄다 삼킨 것은 ‘시간 앞에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상징한다. 주피터와 형제들이 사투르누스를 무찌른 건, 이 신들이 시간마저 이길 정도로 위대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투르누스가 자식을 뜯어먹는 고야의 그림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공포를 자극한다. 인간은 물론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마저도 시간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여지 없이 절대적인 무(無)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고야의 그림 속 사투르누스는 광기에 취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루벤스의 그림 속 사투르누스는 누가 봐도 정신이 멀쩡하다. 맨정신으로 자식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욕망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괴로워하는 얼굴이 보이는 정면에서 아이의 생살을 뜯어먹는 그 모습. 그리스 신화의 신이 사실상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걸 감안하면 루벤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