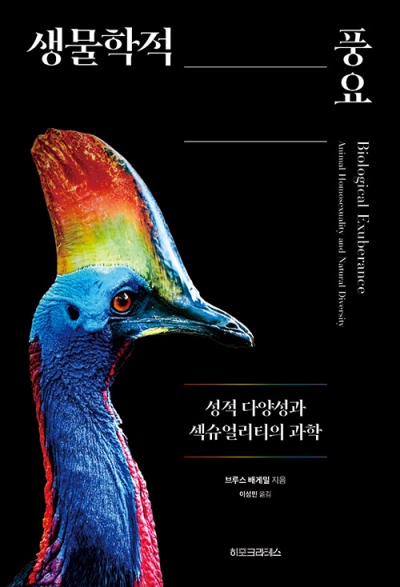"나는 세상의 파괴자"…'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명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오펜하이머'
미국 핵 개발 이끈 과학자의 삶과 고뇌 그려
킬리언 머피·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호연
미국 핵 개발 이끈 과학자의 삶과 고뇌 그려
킬리언 머피·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호연

미국 이론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킬리언 머피 분)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해리 트루먼(게리 올드만)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개를 숙이고 자책하듯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는 오펜하이머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트루먼은 말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핵폭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딴거 신경이나 쓸 거 같소? 그들에겐 투하명령을 내린 사람만이 기억될 거요. 내가 투하명령을 내렸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힘없이 걸어나가는 오펜하이머를 쳐다보던 트루먼은 보좌관에게 말한다. “저 울보를 다시는 여기 들이지 말게".
15일 개봉하는 미국·영국 합작 영화 ‘오펜하이머’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렸다. ‘메멘토’ ‘다크 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등을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덩케르크’(2017) 이후 두 번째로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의 삶에 기반해 만든 장편영화다.

영화는 여러 다른 시간대의 교차 편집과 흑백과 컬러 화면의 사용 등 놀란 감독의 전작들인 ‘덩케르크’와 ’메멘토‘에 나왔던 기법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사를 진행한다. 오펜하이머의 영국 유학 시절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기본 시간대는 총 천연색 컬러로, 1954년 원자력 협회에서 벌어졌던 오펜하이머 청문회는 약간 빛바랜 색감으로, 1959년에 의회에서 있었던 루이스 스트로스(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인사 청문회는 흑백 화면으로 나온다.
이런 기법들은 잘 짜인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접목돼 ‘덩케르크’ ’메멘토’보다 훨씬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 각 시간대를 책임지는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언 머피와 스트로스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각자의 캐릭터에 깊이 몰두해 몰입감 있는 호연을 펼친다.


놀란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오펜하이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며 “다양한 지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 관객을 그의 감정적 여정 속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감독의 언급대로 영화는 ‘트리니티’ 실험 전에 오펜하이머의 개인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실험 후에는 그가 자책감과 매카시즘 등에 시달리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비교적 긴 러닝타임을 감안하면 이런 장면들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송태형 문화선임기자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않고, 다만 쫓아가면서 돈을 챙겼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08761.3.jpg)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방법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0729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