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가·수의 매매 정착…유럽 농민들은 조합 결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산자 가격 교섭력 키워
도매시장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일본도 산지 규모화,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으로 도매시장이 주도권을 잃었다.
14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1989년 83.0%에서 2019년 53.4%로 떨어졌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 중 도매시장을 통해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과일은 도매시장 경유율이 35%대로 주저앉았다. 일본 중앙도매시장 수는 1985년 91개에서 2021년 65개로 줄어들었다. 예전처럼 도매시장의 주 고객이 일반 소매점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일부 대형 도매시장만 살아남은 것이다.
일본은 상대매매(정가·수의 매매)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정가·수의 매매는 생산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줄 상대를 도매시장법인 내 경매사가 연결해주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도 2012년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했지만 가락시장 기준으로 실제 비중은 10년째 10%대에 머물러 있다. 농산물의 90% 이상은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유럽은 19세기 말부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왔기 때문에 산지의 힘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 농민의 90%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생산자가 출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유통상인에게 대항해 가격 교섭력을 키울 수 있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출하하고 APC에서 품질 검사, 선별 및 포장 등을 마친 뒤 산지 경매시장에 보내는 식이다.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럽은 농민이 농산물 생산을, 협동조합이 판매를 담당하는 등 역할이 뚜렷이 구분돼 있다”며 “한국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산자의 가격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도매시장에는 산지에서 경매를 마치고 상품화한 농산물이 입고된다.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이나 구성으로 상품을 재포장·재구성하는 시설, 보관하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한 청과회사 관계자는 “한국도 구매자 주문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도매시장에 물류 창고와 전처리 시설 등을 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14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1989년 83.0%에서 2019년 53.4%로 떨어졌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 중 도매시장을 통해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과일은 도매시장 경유율이 35%대로 주저앉았다. 일본 중앙도매시장 수는 1985년 91개에서 2021년 65개로 줄어들었다. 예전처럼 도매시장의 주 고객이 일반 소매점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일부 대형 도매시장만 살아남은 것이다.
일본은 상대매매(정가·수의 매매)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정가·수의 매매는 생산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줄 상대를 도매시장법인 내 경매사가 연결해주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도 2012년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했지만 가락시장 기준으로 실제 비중은 10년째 10%대에 머물러 있다. 농산물의 90% 이상은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유럽은 19세기 말부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왔기 때문에 산지의 힘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 농민의 90%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생산자가 출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유통상인에게 대항해 가격 교섭력을 키울 수 있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출하하고 APC에서 품질 검사, 선별 및 포장 등을 마친 뒤 산지 경매시장에 보내는 식이다.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럽은 농민이 농산물 생산을, 협동조합이 판매를 담당하는 등 역할이 뚜렷이 구분돼 있다”며 “한국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산자의 가격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도매시장에는 산지에서 경매를 마치고 상품화한 농산물이 입고된다.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이나 구성으로 상품을 재포장·재구성하는 시설, 보관하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한 청과회사 관계자는 “한국도 구매자 주문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도매시장에 물류 창고와 전처리 시설 등을 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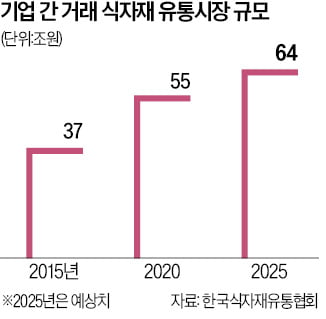
![[포토] 폭염 및 집중호우에 치솟은 농산물 가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19007.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