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지음
위즈덤하우스
316쪽 / 1만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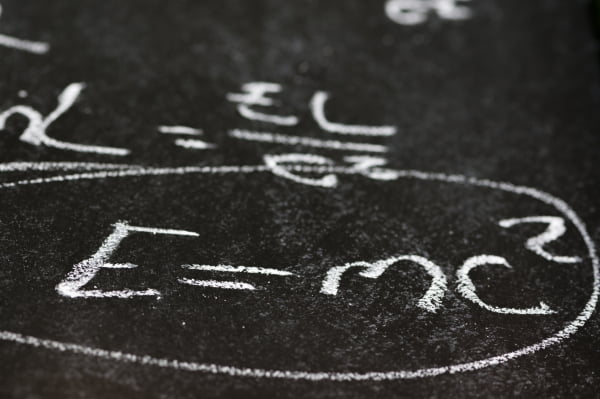
최근 출간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은 '조선은 과학 불모지였다'는 통념을 정면 반박한다. 책은 변화의 물결이 꿈틀대던 구한말, 한국의 과학자들과 관련 논의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운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간 관계를 짚는 등 '우리의 숨은 과학사'를 보여준다.
저자의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책의 구성은 흥미를 자아낸다. 그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다가 우연히 스크린 속 1950년 신문 1면에서 '국력은 과학력'이라는 칼럼을 발견한다. '1950년에 이 땅에서 과학 이야기를?' 의아한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실제 신문에 실렸던 칼럼이었다. 칼럼을 쓴 사람은 1932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최규남 당시 문교부 차관이었다.
저자는 최 차관에 대한 기록을 찾다가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주요 국가에서 주목받던 1920년대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에도 상대성이론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순히 소개된 정도가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순회강연이 열렸고, 주요 일간지와 잡지는 양자역학을 다뤘다. 100년 전에 말이다.
"왜 과학을 알리려던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자는 1895년 서재필의 귀국부터 6·25 직후까지 한국사와 한국과학사의 주요 장면을 짚어나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간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이념 갈등과 혼란이 이 땅의 과학자들을 지워버렸다.
구한말 과학자들은 당대 지식인이었고 일부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들은 나라 잃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과학기술을 토대로 나라를 되찾았다고 봤고, 그 중심에 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주목했다.
"우리 선조들은 무기력하지 않았다." 책은 어쩌면 에필로그 속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 한국 과학자들의 업적과 분투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책의 서술방식이 다소 강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자의 사명감마저 전해진다.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다시는 과학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현실 극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시대를 살았으며, 그들이 소개한 과학으로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다."
저자는 공학자 민태기 씨다.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다. 미국 UCLA 연구원,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주)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으로 누리호 및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