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복귀 반대 위한 명분 안돼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돈풀기의 막장’은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던진 미국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 올린 관세장벽을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추가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했다.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만 280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굴복한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회장은 “세계화는 끝났다”고 말했다. 세계화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에서만 기업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재정의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전쟁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주의는 국가의 명운을 건 이슈가 됐다.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해외 전략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낮은 세금과 값싼 노동력을 쫓아다니는 한국 기업의 생산거점 최적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은 특히 그렇다. 더구나 대외 변수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숙명처럼 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합세해 국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경제계를 대표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곧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간판을 바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싱크탱크와 함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필요성은 정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존망은 정부의 최우선 리스크 관리 항목이다. 갈수록 격렬해지는 글로벌 경제전쟁은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 함께 뛰는 2인3각 게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을 대하는 정치적 프레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단적인 예다.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정경유착 회귀’로 몰고 가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공세는 여전하다. 야권은 전경련에 대해 “제대로 된 혁신 없이 간판만 바꿔 달고 신 정경유착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달라진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기업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자본시장의 감시가 촘촘해졌고,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철저해졌다.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 사회공헌기금은 내부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삼성은 옥상옥으로 지적받는 준법감시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변화에 정부가 관여할 여지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재벌과 특혜, 정경유착으로 연결되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기업을 엮기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경련의 환골탈태 못지않게 과거의 왜곡된 잣대로 기업을 재단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출발점이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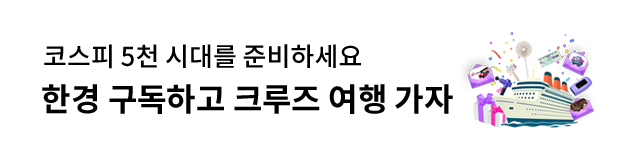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이슈프리즘] '묻지마 괴물' 키우는 인권의 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31671068.3.jpg)
![[이슈프리즘]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15110652.3.jpg)
![[이슈프리즘] 5년 만에 트리플 증가라지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1447712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