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 못 쓰자 왼손으로 서예·피아노까지 [고두현의 문화살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거장들의 '왼손 투혼'
'左手 명필' 김응현 유희강 황욱
절망 딛고 악전고투 '神筆' 경지
한 팔 잃고 '왼손 피아니스트' 재기
양손 연주보다 더 감동 준 대가들
고두현 시인
'左手 명필' 김응현 유희강 황욱
절망 딛고 악전고투 '神筆' 경지
한 팔 잃고 '왼손 피아니스트' 재기
양손 연주보다 더 감동 준 대가들
고두현 시인

한국의 서성(書聖)으로 추앙받는 그는 1999년 교통사고로 오른손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뒤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에 매진했다. 그냥 연습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본격적인 서법을 개발했다. 그 덕분에 2000년과 2001년 한·중 양국에서 왼손 글씨만 모은 ‘좌수서전’을 연달아 열었다.
왼쪽 손바닥으로 붓 잡고 쓰기도
뇌졸중으로 한참을 누워 지냈고 양쪽 눈과 신장, 발바닥 등의 수술을 몇 차례나 하는 동안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신께서 쉬라는 뜻으로 글 쓰던 손을 못 쓰게 했건만 결국 천성을 누르지 못하고 쌍수(雙手) 서예가가 돼 우리 시대의 축복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여섯 살 위인 형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 1921~2006)과 함께 한국 서예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그보다 먼저 왼손 글씨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은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3)이다. 그는 오른손이 떨리는 수전증을 겪자 붓을 손바닥으로 잡고 글씨를 쓰는 악필법(握筆法)을 개발했고, 1980년대 중반 왼손만 사용하는 좌수악필(左手握筆) 서체를 완성했다. 꿈틀거리는 모양의 장엄한 글씨체를 구사했던 그가 65세에 수전증을 손바닥으로 극복한 뒤 왼손만으로 작품을 이어 나간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1911~1976)도 왼손 글씨로 이름난 서예 대가다. 그는 칼같이 날카롭고 견고한 필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호를 ‘칼날 같다’는 의미의 검여(劍如)로 정했다. 50대 후반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몸이 마비됐을 때 그는 불편한 몸을 일으켜 왼손 글씨 연습에 매진했고, 격조 높은 좌수서의 새 지평을 열었다. 좌수 전시회에 이어 왼손 글씨만 엮은 좌수 서예집도 출간했다. 그가 생애 마지막 8년간 보여준 불굴의 투혼과 각고의 노력은 인간 승리의 대표 사례가 됐고, ‘인간 만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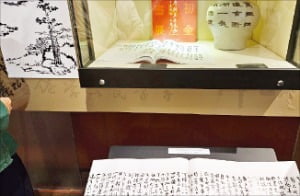
이듬해 풀려난 뒤에는 본격적인 왼손 훈련에 힘을 쏟았다. 1년 뒤인 1916년에는 왼손 피아니스트로 첫 연주회를 여는 데 성공했다. 그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한 손으로 연주한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밀도 높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로써 그는 ‘왼손의 비르투오소(거장)’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와 동갑내기인 게리 그래프먼(95) 또한 왼손 피아니스트다. 그도 오른손이 마비되는 시련을 극복하고 왼손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50대에 오른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그는 작곡가 윌리엄 볼컴에게 왼손을 위한 곡을 부탁했다. 그것도 왼손 하나가 아니라 두 왼손을 위한 곡이었다. 이 곡을 초연한 1996년 그는 왼손 피아니스트 플라이셔와 함께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왼손뼈 27개, 팔뼈 5개로 '협주'
우리나라에도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재기한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씨가 있다. 그는 2012년 미국 신시내티 음대 박사 과정 때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뇌의 60%가 손상되는 바람에 오른쪽 반신 마비에 언어 장애를 겪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혹독한 훈련을 이어가며 감동적인 연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이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우리는 왼손 연주만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들의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다. 더욱이 왼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우뇌와 좌뇌가 함께 발달해 전뇌적(全腦的) 역량이 커진다.
서예 대가들의 왼손 글씨나 피아니스트들의 왼손 연주는 오른손 연습보다 훨씬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더욱 숭고하다. 왼손에 있는 뼈 27개와 팔뼈대 5개 등 32개의 뼈가 협주곡처럼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선율이 나온다. 다산 정약용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느라 복사뼈(骨)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났던 ‘과골삼천(骨三穿)’의 지난한 여정과도 닮았다.
이들은 육체적 훈련뿐 아니라 정신적 성찰을 통해 ‘신필의 경지’와 ‘왼손의 기적’을 일궈냈다. 비운에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플라이셔의 생전 조언이 귀에 쟁쟁하다. “낙담하고 어둠에 싸이고 희망을 잃기는 아주 쉬워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가지고 잠을 깰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 놓고 항상 찾으십시오.”


![디즈니의 ‘올바름질’과 흉악한 창작의 자유 [남정욱의 종횡무진 경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95687.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