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 말아낸 한지 씨앗…언덕이 솟고 용 꿈틀대는 김일화의 캔버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iaf 2023 하이라이트- 호파갤러리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지 화가' 김일화
"종이야 말로 인간 문명의 시작"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지 화가' 김일화
"종이야 말로 인간 문명의 시작"

그렇게 수많은 색색의씨앗들은 빛과 시간에 따라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계의 씨앗(Seed Universe)’ 시리즈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김일화 작가(b.1967)의 이야기다.

“제가 직접 만든 수많은 씨앗들은 언덕과 골의 흐름을 만들어 냅니다. 색과 명암의 대조, 종이의 재질이 더해지면 단단하고 매끄럽게 빛에 반응하는 견고한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시시각각 살아 움직이는 물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색면 씨앗들이 계절의 흐름을 극적으로 담아내면서 하나의 ‘시간의 지도’가 됩니다. 그걸 바라본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지요. 마치 우리집 마당에 10년 동안 서있는 나무나, 태어나서 열살이 된 우리집 강아지처럼 말이죠.”
이번 출품작은 'Dragon Vs. Boy II', 'Tactile Tower', 'Rememberance', 'Spectrum 5' 등이다. 만지지 않아도 시각적 자극만으로 촉각이 살아나는 것같은 느낌으로 제목의 주제들이 은근히 드러난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관람자 스스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추상의 개념도 지니고 있다.

그가 한지, 종이 재료를 꾸준히 작업에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종이야말로 인간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해왔다”며 “금속이나 직물, 다른 물감과 종이 재료들을 결합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국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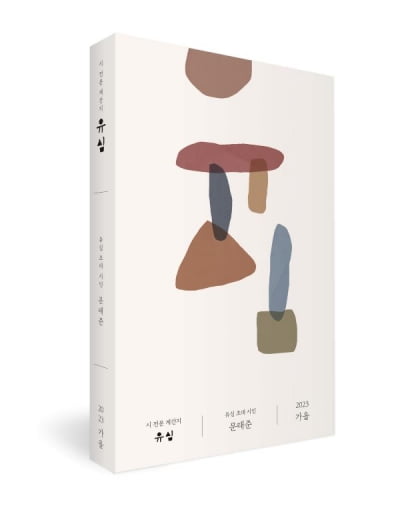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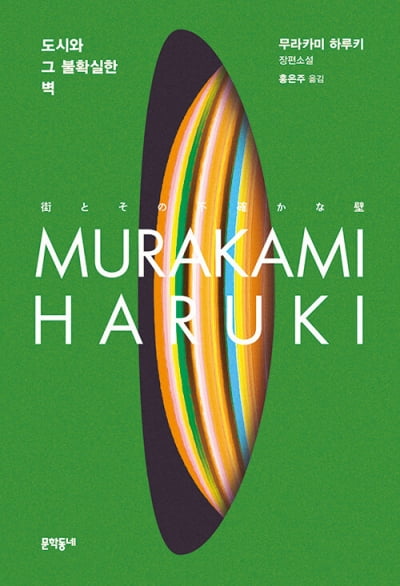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