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네크와 서울시향의 '비창'...삶의 심연을 파고들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호네크X서울시향, 14일 예당서 연주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이야기다. 이날 연주의 하이라이트는 비창을 연주한 2부였다. 1부에서는 드보르작의 '루살카 판타지'와 소프라노 임선혜의 협연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지휘자 만프레트 호네크(65)는 서울시향을 이끌고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통해 40여분간 인생의 심연을 무대 위에 펼쳤다. 교향곡 6번은 차이콥스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로, 그가 세상을 뜨기 9일 전 초연된 사연 많은 곡이다. "비창은 차이콥스키의 유서", "차이콥스키가 자신의 장송곡을 작곡했다"는 설(說)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이런 명곡을 호네크와 서울시향이 어떻게 풀어낼 지가 관전포인트였다. 이들이 4년 전 말러 교향곡 1번을 함께 빚었을 때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지도 관심사였다. 일류 셰프인 호네크가 최근 공연에서 '잘 벼린 칼'처럼 기민하고 안정된 연주를 보여준 서울시향을 어떻게 요리할 지에 클래식 애호가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3악장에서는 비통한 운명에 맞서듯 거칠게 돌진했다. 호네크는 1평 남짓한 포디움 위에서 온몸을 내던지듯 지휘하며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빠른 템포에도 금관 파트와 팀파니가 무너짐 없이 잘 지지해줬고, 격정의 3악장은 불을 지르듯 끝났다. 3악장이 끝나고 악장 간 박수가 나온 건 아쉬운 대목이었지만, 연주자들은 곧바로 다시 4악장, 비관 모드로 돌아섰다.
하이라이트인 4악장은 느린 템포로 부제인 '비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장이다. 이 마지막 악장에서야말로 호네크가 추구한 비창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절망, 비통함, 비애감 등 비창이라는 작품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감각화하고자 하는 듯 했다. 쉼표가 주는 적막감에서는 시고, 맵고, 쓴맛이 감돌았고, 하강하는 음형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과정에서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삶을 연상케 했다. 두드러지는 테누토(음표 길이를 충분히 연주)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먹먹함이 느껴지게 했다.
서울시향에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연주였다. 이들의 물오른 연주력과 호네크의 '봉준호급' 디테일이 만나 어느 때보다 해상도 높은 비창이 완성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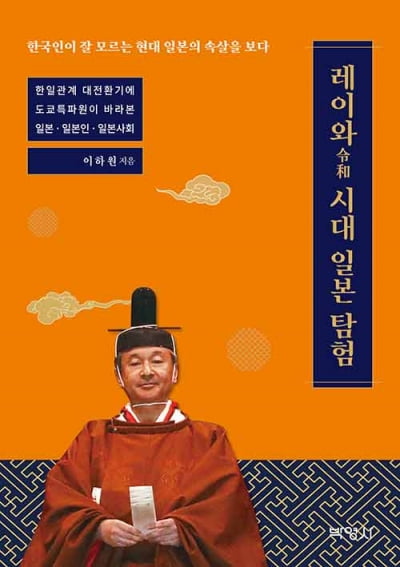

![전직 에르메스 조향사의 향수 이야기… 식물은 어떻게 매혹의 물이 되는가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18749.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