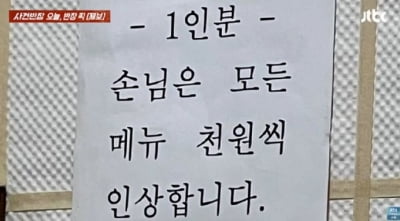『자코메티의 아틀리에』(2007, 열화당), 장 주네 지음, 윤정임 옮김

나의 실존 탐구는 20대에도 이어졌다. 그 시절 주머니는 넉넉하지 못해도 매달 대학로 극장 앞을 서성였다. 프랑스 극작가이자 시인인 장 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재해석한 연극을 보고 나서 그가 쓴 《자코메티의 아틀리에》를 찾아 읽었고, 알베르토 자코메티란 조각가를 처음 알게 되었다. 주네는 이 책에서 “자코메티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더욱더 견딜 수 없어지는데, 그것은 이 예술가가 거짓된 외양이 벗겨진 후 인간에게 남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 자기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을 치워버릴 줄 알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썼는데, 그 시절 나는 ‘벗겨진 후 인간에게 남은 것’이란 구절을 주기도문처럼 외었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K와 통화를 끝낸 후, 책장에서 《자코메티의 아틀리에》를 꺼내 읽다가 15년 전 밑줄 그은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각개의 대상은 ‘홀로’ 있을 수 있기에 아름답다.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나는 혼자다. 그러므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필연성에 대항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대로의 나일 수밖에 없다면 나는 파괴될 수가 없다.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 그리고 나의 고독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신의 고독을 알아본다.”
《자코메티의 아틀리에》는 화집이나 도록이 아니다. 책 속에는 자코메티의 그림이나 조각, 사진이 없다. 1954년에서 1958년까지 4년간 주네가 자코메티의 아틀리에를 드나들면서 그와 나눈 대화와 그의 작업을 보며 정리한 예술론이 있다. 20대의 내가 실존을 고민할 때 이 책의 귀퉁이에 적은 메모는 이렇다. “전체성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과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생존과 실존이란 무엇인가. 생존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 실존은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면서도 끝내 지켜야 하는 무엇이 아닐까.”
“서 있기 위해서는 매 순간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 순간넘어질 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인간은 멋진 그림이나 조각을 위한 핑곗거리가 아니다. 캔버스나 재료는 내가 보는 것을 더 잘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한 그의 조각을 다시 보면서, 나는 인간의 뼈와 피를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살아 있는가. 어떻게 살아 있는가. 내 비곗덩어리가 썩어 사라진 내 형상은 어떠할 것인가. 실존에 대해 지독히 묻는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때 실존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왜 이토록 실존에 집착하는가. 사람의 피는 어떻게 한평생 몸에 갇혀 있는가. 내가 먹은 것들은 어떻게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정신이 되는가.
뼈, 나를 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 나를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뼈만 남은 어느 존재의 눈동자는 허약하지 않은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고두현의 문화살롱]](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A.345529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