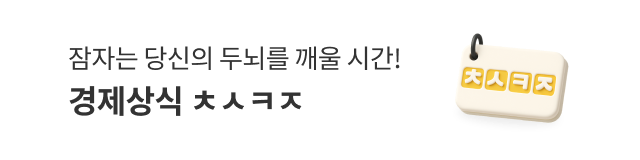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11)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비치코스 6번홀(파3)
남해 바다와 맞닿은 골프장
세계적 명문 페블비치CC처럼
해안가에 터 잡아 빼어난 풍광
페어웨이에 벤트그래스 심어
5성급 호텔 서비스 선보여
골프장에서 휴식까지 '올인원'
직원들 고급 식당·호텔서 교육
대부분 드라이버 잡는 파3
블랙티 215m, 화이트티 182m
온 그린 확률 20%에도 못 미쳐
"한국서 가장 아름다운 파3홀"

파인비치는 해안에 들어선 국내 첫 골프장이다. 설계할 때부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클럽하우스 위치를 결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한다.
비치코스 6번홀(파3)은 이런 파인비치에서도 가장 멋진 시그니처홀이다. 3면이 남해에 둘러싸인 이 홀은 페블비치CC에 버금가는 명성의 미국 사이프러스포인트CC의 16번홀을 빼닮았다. 골프다이제스트를 포함한 국내 유력 골프매거진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3홀’로 꼽았다.
티잉 구역에 올라서자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에메랄드빛 남해 건너편에 있는 그린을 향해 치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구조여서다. 유명 골프 여행작가 류석무 씨는 이 홀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는 표현만으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잘 가꾼 정원 같은 코스
2010년 문을 연 파인비치는 라이벌 사우스케이프보다 3년 먼저 개장했다. 호남 기업인 보성그룹이 한국관광공사가 조성한 화원관광단지에 골프장 부지를 확보했다. 그 덕분에 바다와 맞닿은 골프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연안관리법은 바다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단지는 국토 균형 개발 명분으로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파인비치는 해안 코스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골프장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경치와 코스 빼곤 딱히 내세울 게 없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데 따른 한계도 뚜렷했다.
파인비치는 돌파구를 고급화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오크밸리CC와 남양주 해비치CC 총지배인 등을 지낸 허명호 대표를 2019년 영입한 뒤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고쳤다. 목표는 ‘5성급 호텔 서비스’를 골프장에 입히는 것. 매년 직원들을 서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등으로 ‘교육 출장’을 보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아이보리를 ‘파인비치 색’으로 정하고 모든 인테리어를 여기에 맞췄다. 허 대표는 “주변에 별다른 관광명소가 없는 만큼 골퍼들이 식사부터 휴식까지 골프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바꿨다”고 말했다.
켄터키블루그래스와 벤트그래스가 혼재됐던 페어웨이와 티잉 구역 잔디는 값비싼 벤트그래스로 싹 다 바꿨다. 그렇게 파인비치를 포근하고 아기자기한 명문 코스로 재탄생시켰다. 허 대표는 “사우스케이프CC가 바닷바람을 뚫고 치는 남성적인 코스라면 파인비치는 잘 가꾼 정원 같은 느낌을 주는 코스”라고 말했다.
○바다 건너 215m를 날려야 하는 파3홀
한눈에도 그린은 저 멀리 보였다. 블랙 티 215m, 블루 티 189m. 눈앞에는 남해가 입을 벌리고 있다. 슬금슬금 화이트 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82m라 블루 티와 별 차이도 없지만. 이 홀에서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티박스는 레드티(94m)뿐이다.하지만 많은 여성이 레드 티가 아니라 옐로 티(162m)에서 친다고. 레드 티에선 바다를 건너 공을 때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캐디는 “대부분 드라이버를 잡지만 ‘원 온’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온 그린’ 확률은 2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골퍼들이 왜 이 홀을 보기에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에 비유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다.
화이트 티에 꾹 눌러놓은 티를 허 대표가 뽑더니 입을 열었다. “이 홀이 왜 한국 최고 홀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블랙 티로 가야 합니다.”
215m면 당연히 드라이버를 꺼내야 하지만 장고 끝에 3번 우드를 쥐었다. 파3홀을 드라이버로 쳐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하지만 공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런 선택을 후회했다. 강한 바닷바람을 이기지 못한 공은 그린에 한참 못 미치는 지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다시 한번 쳐보라”는 허 대표의 말에 힘을 ‘빡’ 줬더니 보기 좋게 ‘뒤땅’이다. 결국 1벌타를 더 받고 그린 주변에 공을 놓은 뒤 5온 2퍼트, 쿼드러플보기. 스코어 카드에 ‘+3’(양파)만 적어준 캐디에게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다.
파인비치는 프리미엄퍼블릭 골프장답게 티 간격이 10분이다. 앞 팀과 뒤 팀을 볼 일이 없다. 비치코스만큼이나 파인코스도 인기다. 파인코스 8번홀(파3)을 이 골프장 시그니처홀로 꼽는 골퍼도 많다고. 파인비치의 또 다른 별명은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골프장’이다. 한번 와보면 왜 이런 별명이 생겼는지 곧바로 알 수 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