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변호사 "印서 합작법인 설립땐 '헤어질 결심'도 해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도 생활 10여년…김종봉 변호사의 조언
韓 상식과 다른 일 종종 있어
현지진출 전략 신중하게 짜야
韓 상식과 다른 일 종종 있어
현지진출 전략 신중하게 짜야

김종봉 미국변호사(58·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1위 알루미늄 거푸집 제조업체 삼목에스폼의 인도법인 대표를 지냈다. 10여 년간 삼목에스폼의 인도 진출 준비부터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등을 총괄했다. 2012년 11월~2013년 12월 KOTRA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초대형 시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인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9.1%, 지난해 7.0%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약 14억 명의 인구가 모인 인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건설 자동차 가전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 정치권 부패가 줄면서 인도의 이 같은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했다. 삼목에스폼도 건설 공사가 활발한 점에 주목해 인도에서 건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판매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인도 시장의 크기에 끌려 철저한 준비 없이 진출하면 실패로 끝나기 쉽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인도에선 계약하고 서명까지 했던 상대가 다른 기업과 거래하겠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품을 먼저 써본 뒤 만족하면 한 달 뒤 송금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에서의 상식과 안 맞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에선 제대로 된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낼 때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 자금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인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전략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도에서는 기업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통 합작법인 지분 비율이 50 대 50이나 51 대 49임을 고려하면 인도 기업이 합작법인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합작 관계가 깨지는 경우까지 고려해 사업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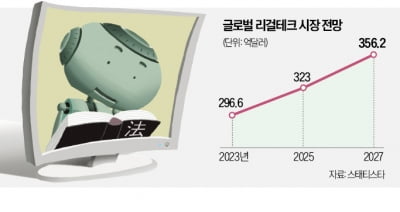

![[속보] 인도·네팔 국경지역 규모 5.2 지진 발생[로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99.107863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