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프로코피예프 교향곡을
깊고 우아한 빈 필 음색으로 표현
소키에프 독특한 지휘동작 '눈길'
랑랑은 생상스 협주곡 2번을
다채롭고 긴장감 넘치게 연주

그럼에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빈 필의 첫날(7일) 무대는 몇 가지 이유에서 클래식 마니아라면 꼭 찾아 들어야 할 만한 공연이었다. 먼저 이례적인 프로그램. 최근 10년간 빈 필의 내한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거의 예외 없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계열 작품이었다. ‘오스트리아 대표 악단’이란 정체성과 국내 관객이 이 악단에 기대하는 바를 감안하면 당연한 선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빈 필의 전부일까? 홈그라운드인 빈과 잘츠부르크에서 빈 필은 상당히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악단이다. 따라서 생상스와 프로코피예프를 들고 온 이번 공연은 그동안 관객들이 간과해 온 빈 필의 또 다른 면모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다.
두 번째는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의 협연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상스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 랑랑은 2017년 팔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졌고, 복귀 후에는 비교적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레퍼토리를 주로 다뤄 왔다. 하지만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탁월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생상스조차 부담스러워한 난곡이다. 그렇다면 이제 랑랑은 강력하고 현란했던 과거의 피아니즘을 온전히 회복한 것일까?
이번 협연을 통해 확인한 랑랑의 연주력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원활하고 설득력 있었다. 약점은 주로 오른손에서 감지됐는데, 빨리 쳐야 할 구간에서 타건의 강도와 아티큘레이션(각 음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연주하는 것)의 명료도가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랑랑 특유의 풍부한 상상력과 재기발랄한 감각으로 덮어졌다.
특히 1악장에서 두드러진 다채로운 터치와 뛰어난 즉흥성, 2악장 중간에서 의표를 찌른 돌발적 악센트, 3악장에서 순간적 변속을 통해 긴장감과 흥분감을 한껏 고조시킨 수법 등이 돋보였다.
마지막 포인트는 지휘자 투간 소키에프의 존재다. 이번 프로그램 구성도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악단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그의 이력이 반영된 측면이 컸을 것이다. 소키에프는 상당수 청중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제5번’을 차분하고 온건한 해석으로 들려줬다. 템포는 대체로 느린 편이었고 주제나 섹션 간 대비는 완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 덕분에 관객들의 부담은 줄어들었겠지만, 한편으론 프로코피예프 음악 특유의 자극적 쾌감과 극적 선명성이 희석된 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소키에프의 해석에는 흥미로운 면도 적지 않았다. 1악장 주요 섹션의 템포와 강도를 미묘하게 조절해 악장 전체를 거대하고 점진적인 크레셴도(점점 강하게) 구도로 이끌어간 부분에서 그의 해석이 악곡에 대한 거시적 조망에 기초한 노련하고 심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나아가 그가 선택한 여유로운 템포는 빈 필 고유의 음색을 한층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우아한 빈 필의 음색이 도처에서 빛을 발하며 감탄을 자아냈다. 이를테면 3악장 초입에서 목관 앙상블에 이어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등장할 때의 그윽한 음감이라든가, 같은 악장 중간에 나오는 비극적 고조부를 지나 몽환적 흐름으로 복귀할 때의 환상적인 음률 등은 오직 빈 필만이 들려줄 수 있는 매혹적인 연주의 표본과도 같았다.
빈 필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들만의 ‘황금빛 사운드’와 앙상블로 들려주는 프랑스나 러시아 음악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청중의 반응도 사뭇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앙코르는 빈 필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서곡과 폴카였다.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은 오묘한 화성과 재치 있는 리듬이 어우러진 오프닝이 인상적이었고, 유명한 폴카 ‘천둥과 번개’는 빈의 흥취를 청중에게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끝으로 소키에프의 지휘 동작은 세심하고, 능수능란하고, 매력적이었다. 이 점 꼭 언급해 두고 싶다.
황장원 음악칼럼니스트




![[포토] 서울서 울려퍼진 빈 필의 ‘황금빛 사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501493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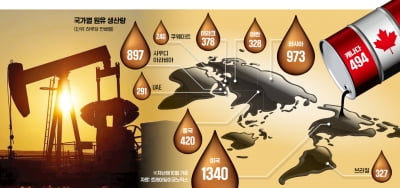


![[속보]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3.180238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