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절정인 어느 날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에서 보낸 이틀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석주 시인·문학평론가
절반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절반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단풍이 절정인 가을은 그 어떤 보석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고귀합니다. 나는 그 이틀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서 지냈습니다. 이 가톨릭 수행 공동체는 1927년 함경남도 원산 인근의 덕원에 처음 자리 잡습니다. 6·25전쟁 때 사제들이 인민군에 의해 순교하는 등 고초를 겪은 뒤 성 베네딕도회는 북녘 덕원을 떠나 남녘 왜관에 정착한 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서 세미나를 하고 위층 피정의 집 숙소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수도원을 찾은 것도, 수도원에서 잔 것도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방에는 1인용 침대 둘, 책상, 세면대, 벽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형상과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라는 표어가 적힌 달력이 있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눕히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켜져 있고 키 큰 나무들이 풀밭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 있습니다.피정의 집에서 마련한 아침식사를 했는데, 식단은 밥과 황탯국, 전복죽, 김치, 두부부침, 시금치무침, 멸치볶음 등으로 조촐했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먹을 만큼 덜어 와서 먹었습니다. 반찬은 정갈하고 간이 세지 않아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파이프 오르간 선율이 장엄하게 공명하는 성당에서 성 베네딕도 수도회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왜관수도원은 출구에서부터 대숲이 이어지고,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뜰에는 감나무, 느티나무, 금목서, 키위나무 따위가 자라고, 가톨릭 성인의 동상이 서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머무는 이틀 동안 나는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편도나무에게 말했노라./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다.” 젊은 시절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번민하고 방황했습니다. 신과 진리에 관해 얘기해 줄 편도나무가 없었던 까닭에 나는 많은 의문과 물음에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편도나무야, 신에 대해 말해다오
인류는 홀로코스트, 크메르루주, 난징대학살을 겪으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6·25전쟁 300만 명, 베트남전쟁 400만 명, 소련·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란·이라크전쟁에서도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희생자 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아이입니다. 왜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전능하다는 신은 왜 이런 악행에 대해 눈감고 침묵만 하는 것일까요? 그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신을 믿고 죽음이라는 실존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의 현존을 의심하고 종교라는 울타리 안쪽을 기웃거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불경 따위의 경전을 섭렵했으나 믿음을 얻지 못한 채 회의주의자로 남았습니다.대체로 종교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천국이나 영생 같은 구원은 내세에나 실현될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시제의 일이고, 그것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입니다. 그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 구원과 진리들은 실내 공기처럼 안락하지만 어딘지 정체됐다고 느껴집니다. 과학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에 더 마음을 빼앗긴 까닭에 나를 유신론적 신앙체계에 묶어두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썩으면 내 자아 중에 살아남는 것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젊지 않으며 삶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사멸한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짓을 경멸한다. (중략) 설령 활짝 열린 과학의 창문들이, 처음에는 대대로 내려온 인간화한 신화들이라는 안락한 실내 온기에 적응돼 있던 우리를 덜덜 떨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드넓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장엄함을 드러낼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543쪽) 나는 차라리 리처드 도킨스의 도발적인 논거들에 더 공감하는 편입니다.
절반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 집에 머무는 이틀 동안 나는 빈방에서 무릎을 꿇은 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삶의 찰나가 영화필름처럼 흘러가는 가운데 심장이 크게 뛰고 피들은 아우성쳤습니다. 내 존재는 혼돈에 내동댕이쳐지는 것 같고, 나는 강가의 흔한 돌멩이 중 하나인 듯 외로웠습니다. 내 입술에서 ‘어머니!’라는 짧은 부르짖음이 흘러나옴과 동시에 눈물 몇 방울이 솟구쳤습니다. 왜 어머니를 불렀을까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나는 그동안 절반의 삶만을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 ‘절반의 삶’을 두고 한 시인은 “절반의 삶은 그대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것이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칼릴 지브란, ‘절반의 생’ 일부)라고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헐벗고 가난했던 것은 절반의 삶만을 살았던 탓일 겁니다.
이제 가을의 이틀을 먹고 자며 보낸 수도원을 떠납니다. 수도원에 있는 동안 불신에서 벗어나 신실한 신자가 되는 계기를 찾거나 사랑의 외로운 직무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는 우주 궤도를 도는 해와 별들에 감사하고, 단 한 번도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에 대해 감사하고,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당신과 나의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부디 당신과 내가 절반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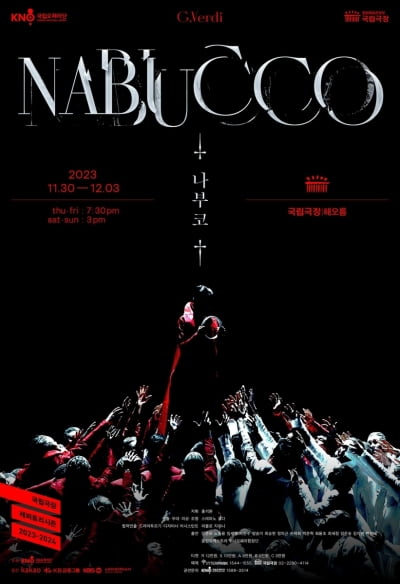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