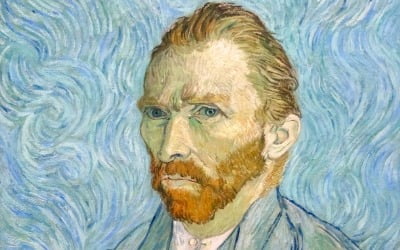예술과 사랑 :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
& 안토니오 곰리의 <다른 장소>
“냉철함이 다른 세기들 사이를 다리에 놓을 수 있다면 열정은 왜 그렇지 못한단 말인가?”
-제임스 엘킨스 1)
*
두 작품이 있다. 모두 공공미술이다. 첫 번째 것은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다. 뉴욕 연방 광장을 오만하게 가로지른, 게다가 위협적으로 기울어진 녹슨 강철벽은 그 공간을 일상으로 점유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쳤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이 예술이라는 선언을 거부했고 폐기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그 흉물스러운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 다수는 예술가나 관련 종사자들이었다.결과는? 1989년, 8년간의 다분히 소모적인 논쟁 끝에 철거되었다. 법은 이를 막기 위한 작가의 주장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과 예술의 차이인가?(너무 낭만적인 접근이다) 세라의 의도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인식론의 자투리쯤으로 보인다.
일테면 이렇다:<기울어진 호>가 하나였던 광장을 둘로 나누고, 익숙한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민들을 무지와 무감각에서 깨우고, 그 방해와 불편함의 출처는 광장 앞에 있는 연방청사(정부)라는 점을 일깨우는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 거대한 녹슨 구조물이 정작 광장이 조용히 수행해오던 공공성을 훼손했고, 이런 덧없으며 대체로 위선적이기도 한 계몽은 미술관 안으로 족하다는 것이었다. 드물긴 하지만 제대로 된 법의 판결문은 충분히 미학적이다.
두 번째 것은 안토니오 곰리(Antony Gomley)의 <다른 장소.Another Place>다. 설치는 1997년 독일 쿡스하벤 해변에 처음 설치된 이후로 노르웨이의 슈타방거와 벨기에의 드판 해변로 이어졌다. 해변을 따라 설치된 100개의 강철제 인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목까지 물에 잠긴다. 모두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듯 멀리 수평선을 바라본다.
기원이 담긴 시선, 영원을 향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그 간절함 안에 모더니즘에 의해 지워진 것들의 미학적 복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도로 정제된 미(美), 영웅적인 단순성, 질서를 향한 프로메테우스적인 돌진만을 진실로 여기는 강박의 대지를 이제는 떠나야 하리라는 지긋한 자각. 예컨대 미니멀리즘과 그 유산의 땅을 등지고서 먼 곳을 향한다. 1970년대 순수회화를 공부하던 리용의 대학생이었던, 훗날 세계적인 벽화 그룹이 될 ‘시테 크레아시옹(Cite Creation)’의 발기인이자 오랜 리더이기도 했던 질베르 쿠덴느(Gilbert Coudène)가 다짐했던 것과 맥락을 공유하는 ‘떠남’ 이다.
“나의 대학 시절 미니멀리즘이 터무니없는 지시를 동반하곤 했는데, “진정 그리고 싶다면 그리지 말아라(If you want to paint, don’t paint)”가 그것이었다. ...(내 생각에) 그건 전적으로 퇴폐적이며 호사스런 엘리트주의로 ... 이러한 미술계의 현실이 나의 창작 열정과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제약과 통제를 가했다. ... 미국 미니멀리즘과 컨셉츄얼리즘의 오만하고 돈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좌절했다.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했고 정치적 옮바름에 대한 갈증이 고조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퇴폐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사회 자체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대학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
많은 사람이 설치된 광경을 보기 위해 현지를 찾았다. 1백 개의 녹슨 신체들 사이를 거닐며 흥미로워했고, 즐거워했고, 일상적이지 않은 감흥을 받았다. 영국 리버플의 크로스비 해변(Crosby Beach)에서 이 공공미술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소송 사건이 일어났다. 수상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해경과 철새 서식지의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를 들어 지방의회가 곰리의 인물상들을 해변에서 철수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로스비 해변이 저 먼 곳을 향한 기원의 시선의 장소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어나더 플레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방의회의 결정에 항소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에 지방의회는 인물상의 수와 설치 면적을 줄이는 조건으로 인물상들이 해변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세라의 <기울어진 호>와 곰리의 <다른 장소>, 두 작품 모두 ‘미술관 미술(museum art)’의 불구성이나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같은 당대 논쟁에 스스로 가담했다. 세라는 광장을, 곰리는 해변을 찾았다. 리용의 질베르 쿠덴느가 그랬듯, 이 둘도 뉴욕과 런던에서 미술관을 떠나 구체적인 장소를 점유하며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했다. 하지만, 두 상이한 접근은 극적으로 다른 최후를 불러들였다. 전자는 주민들의 반대로 세 조각으로 분해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후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중과 언론의 큰 지지를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장소를 찾는다. 어떤 차이인가?두 사건 모두에서 시민은 수동적인 방관자나 감상자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참여자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 에술, 정확히 하자면 제도화된 예술에 있다. 단지 공공의 이해에 무심한 공공미술의 판에 박은듯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훨씬 더 큰 미술사적, 문명적 패러다임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단초를 “미술관의 메마른 교육적인-계몽적인- 태도”에 대한 시카고 아트인스티튜드의 미술사가 제임스 엘킨스(James Elkins)에서 마주할 수 있다.
엘킨스 교수는 ‘미술관 미술’화된 현대미술에 각인된 인간적 메마름의 태도를 문제삼는다. 미술관에서 의례 마주하는 작고 메마른, 가르치려는 태도로 가득한 설명 판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다. 누가 그런 설명 판을 만드는가? “그런 설명 판을 만드는 사람들 대다수를 교육하는 대학의 미술사학과와 미술비평 학과들은, 감탄해서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 앞에서 과거 문화에 관한 지식을 늘어놓음으로써 그림의 공적인 얼굴을 냉담하게 만들어놓는다.”2) 학생들은 문서보관소를 전전하고 고서들을 샅샅이 뒤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반응은 관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몸에 익힌다. 이들의 견해가 어떤 점에서 <기울어진 호>의 철거나 <다른 장소>의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인가?


엘킨스 교수는 미술사학자로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질문을 소개하며 긴 글을 마친다. “평생을 보고 지내면서도 실제로 눈물 한 방울 흘릴 정도로 감동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4)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본 적이 없는 것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 그렇다면 그 저주는 근대예술과 미학의 서사 전반에 걸려있는 흑주술(黑呪術)일 수도 있다.1) 제임스 엘킨스, 『그림과 눈물』, 정지인 옮김(아트북스, 2016) p.361.
2) 앞의 책, p.352.
3) p.353.
4) p.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