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키퍼…'노잼 도시' 대전 바꾼 '꿀잼 전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눈길끄는 전시회 잇따라 개최
'미술 한류 원조' 이응노展에는
프랑스서 미공개작품 대거 공수
대전엑스포 30주년 기념전과
'거장' 키퍼 첫 국내 개인전 등
미술계 빅이벤트로 관심 모아
'미술 한류 원조' 이응노展에는
프랑스서 미공개작품 대거 공수
대전엑스포 30주년 기념전과
'거장' 키퍼 첫 국내 개인전 등
미술계 빅이벤트로 관심 모아

변화는 시작됐다.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은 서울에서도 만나기 힘든 ‘꿀잼 전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두 달 전 개소한 문화공간 헤레디움은 서울을 제치고 유치한 현대미술 거장 안젤름 키퍼(77)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서울에 이은 ‘제2의 미술수도’를 꿈꾸는 대전의 ‘시그니처 전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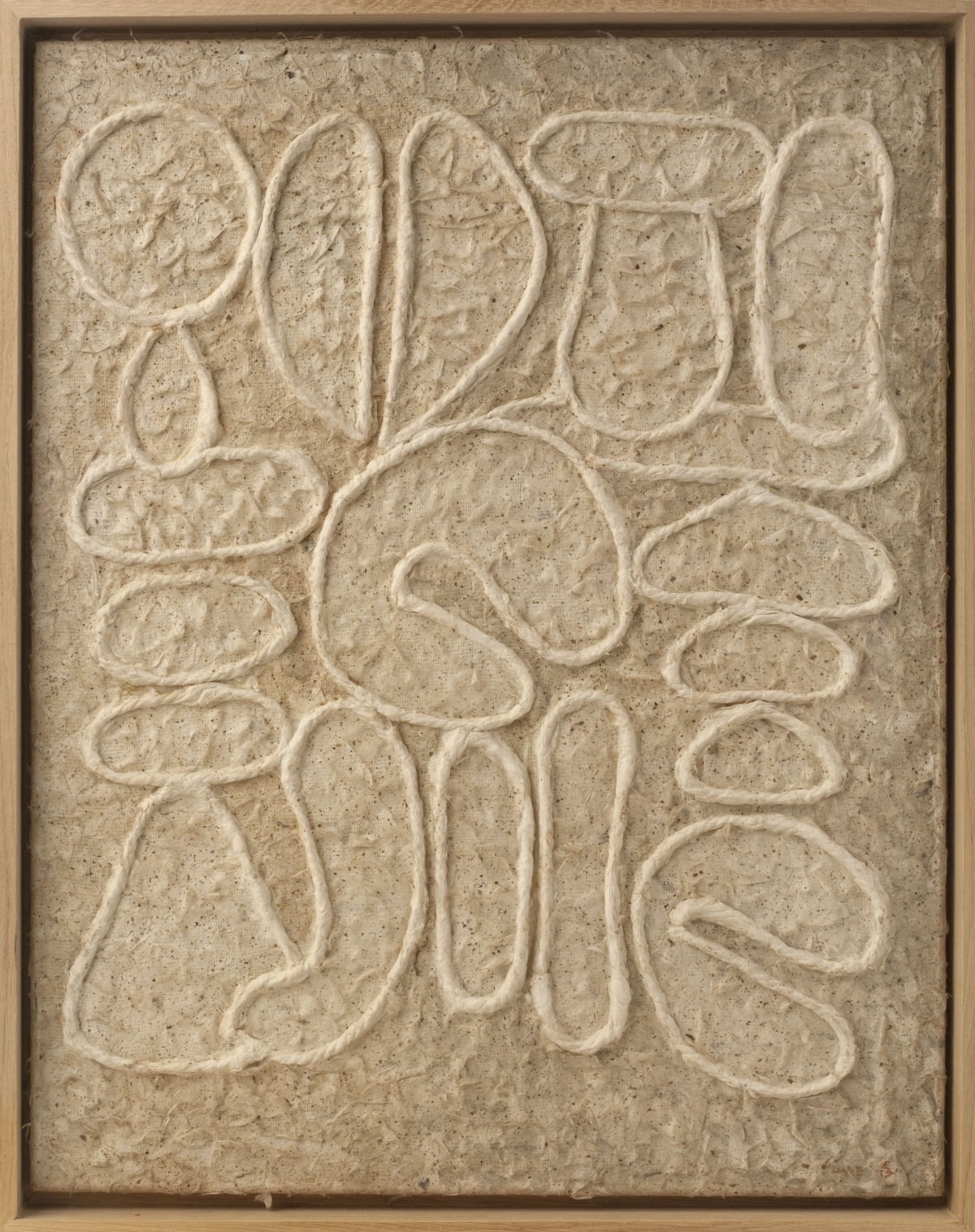
‘미술 한류 원조’ 이응노를 아십니까
고암 이응노(1904~1989)는 ‘미술 한류(韓流)’의 원조로 꼽히는 화가다. 1958년 54세에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 현지 미술계의 ‘슈퍼스타’가 됐다. 하지만 이응노의 국내 인지도는 국제적 위상에 한참 못 미친다. 작품세계 전반을 돌아보는 전시도 드물었다.사연 많은 그의 인생 탓이다. 이응노는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으로 2년이 넘는 옥고를 치렀다. 아내 박인경 주도로 1977년 윤정희·백건우 부부가 납북될 뻔한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 정부는 그의 입국과 국내 전시 및 작품 거래를 한때 금지하기도 했다.

이응노가 수묵으로 화선지에 그린 ‘군상’(1985) 등 대표작들도 만날 수 있다. 서양인이 개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수묵으로 스케치한 ‘파리 사람’(1976)도 흥미롭다.
다만 전시장이 지나치게 어두운 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림을 빌려준 해외 미술관들이 작품 보호를 위해 조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색감이 어두운 작품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볕이 잘 드는 날 천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더해지면 그나마 낫다. 전시는 내년 3월 3일까지.

대전에서 느끼는 거장의 숨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미래 저편에’도 흥미롭다. 이 전시는 30년 전 대전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열렸던 똑같은 이름의 전시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당시 전시는 폰투스 훌텐 퐁피두센터 초대관장과 임세택 서울미술관장이 공동 기획하고 니키 드 생팔, 김기창, 박서보, 백남준 등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35명이 참여해 국내외 미술계에서 화제를 모았다.전시장에서는 레베카 호른의 ‘한국의 경치 그리기’, 톰 섀넌의 ‘광선구’, 장 팅겔리의 움직이는 조각 ‘무제’ 등 지난 전시 이후 손상된 작품이 복원돼 관객을 맞는다. 니키 드 생팔의 드로잉과 백남준의 자필 메모, 전시장 설계도면도 함께 나왔다. 전시는 내년 2월 25일까지.

대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