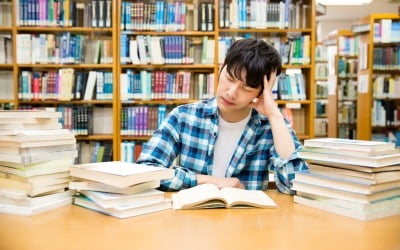김태호 지음
역사비평사
320쪽|1만8500원

이제 회사는 물론 열 걸음마다 나오는 카페에서도 노트북 타자 치는 소리는 '디폴트'(기본값)다. 현대인에겐 타자 치는 능력은 생존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발품을 팔아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아도, 타자만 칠 줄 알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타자 치는 게 쉬웠던 건 아니다. 한글 기계화 역사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굴곡이 있었다. 20년간 한글 타자기 연구를 이어온 김태호 전북대 교수는 신간 <한글과 타자기>를 통해 지금의 한글 타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상세히 뤘다.
현대 타자기의 원형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미국에서 만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로마자 타자기를 자기네 문자와 접목하고자 했는데, 서로 방향이 달랐다.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버리지 않았기에 거대한 글쇠 묶음 속에서 완성된 글자를 찾아서 찍어내는 ‘옥편식 타자기’로 방향을 잡았고, 우리나라는 로마자 타자기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며 ‘한글 타자기’를 개발했다.
간단한 과정은 아니었다. 글자를 한 줄로 길게 쓰는 식으로 단어를 완성하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한데 모여 하나의 음절 글자를 만드는 ‘모아쓰기’ 성격이어서다. 기술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1960년대까지 세로쓰기와 한자를 혼용해서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한자 없이 한글만으로 가로쓰기하는 건 '혁명'이라 할 만큼 낯선 것이었다.

이후 김동훈, 백성죽 등 여러 발명가가 타자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1950∼1960년대 한글 타자기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1968년 각 정부 부처가 이용하는 한글 타자기 수가 1만 대를 훌쩍 넘어서고, 시판 타자기 종류가 13개에 이를 정도였다. 이에 1969년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표준 자판을 공포했는데, 국가가 제정한 첫 번째 한글 표준 자판은 세벌식이 아닌 '네벌식'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지판 표준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은 새로운 표준을 모두 따르도록 강제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던 공병우의 세벌식 타자기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밀려났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판은 1983년 정부가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산에 따라 전산기기와의 통일성을 고려해 새로운 표준 자판으로 지정한 ‘두벌식’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자판도 아닌 그 이전의 자판에 대해 왜 이토록 자세히 알아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온전히 기억하고 제 몫을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과거의 다양한 시도들이 ‘정답에 이르지 못한 시행착오’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책은 어느 자판이 가장 우수했는지, 또는 어느 자판이 표준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표준이 되지 못하고 잊혀간 지판이 얼마나 많았는 지에 주목하고, 그들의 특징과 개성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는 “표준화 이전의 한글 타자기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