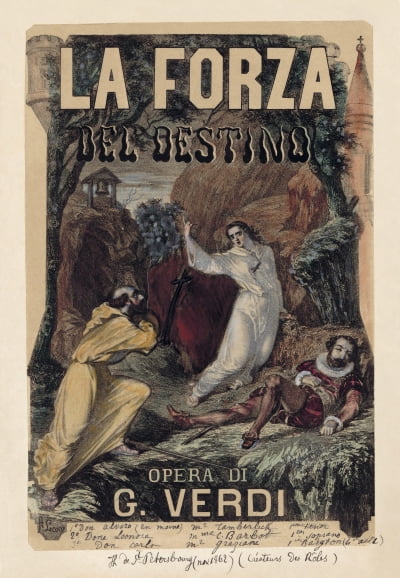올 겨울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미셸 들라크루아의 따뜻한 기억 속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임지영의 예썰 재밌고 만만한 예술썰 풀기

눈오는 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찬날씨와는 상관없이 마음을 덥힌다. 방울 모자를 쓴 아이가 눈을 맞으며 깔깔 웃는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는 구두코에 잔뜩 힘을 주고 뒤뚱뒤뚱 걷는다. 누군가 문득 멈추어 눈오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 덕분에 모두의 눈에 한결 즐거운 미소가 어려있다. 그러다가 퍼뜩 그 그림이 생각이 났다. 미셸 들라크루아의 눈 오는 풍경 그림. 마침 두시간쯤 여유가 있고, 멀지 않은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운명이다, 그를 만날.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퍽 많았다. 모두들 운명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겨울에 보기에 이보다 좋은 전시는 없을 것이다. 두터운 외투조차 이 전시엔 안성맞춤같다. 들어가자마자 미디어아트가 우리의 미소를 끌어낸다. 미셸 들라크루아의 그림들이 영상 속에서 빛나거나 움직이고 있다. 음악은 벨에포크 시대의 음악들, 나도 모르게 사뿐사뿐 춤추듯 걸었지 뭐야. 곁에 선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 소리마저 흥겨워진다. 게다가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코 끝에 서리는 향. 벨에포크 시대의 향을 느껴보라고 써있는데, 디퓨저가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공감각 정말 좋다. 전시는 우리를 생동시키는 무엇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예술은 감각을 더욱 깨어나게 한다. 눈을 반짝이며, 코를 킁킁거리며, 마음은 두근거리며 내내 그곳을 누렸다.

작가는 말한다.
'과거의 파리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 그림들은 과거에 대한 사진이나 문서가 아닙니다. 인상에 대한 기록들이죠.'
작가는 파리를 사랑하고 거기서 만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걸 절대 잊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기억에 남기고 싶은 모든 걸 그림으로 기록했다. 눈길을 달리는 마차, 가스등을 켜는 사람, 어머니와 산책, 강아지 퀸까지. 그리고 이제 아흔이 넘은 작가는 구부정한채 말한다. 소소한 행복도 짊어지기 어려울만큼 힘든 일도 나는 단지 그 모든 걸 그렸다고.

아마 존재의 방식일 것이다. 미셸 들라크루아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었어도 자기 삶의 충실한 기록자로서 계속 그렸을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매일 똑같이 지나다녀도 늘 다르게 다가오는 파리의 시간들, 작가는 매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록자, 우리는 그들을 예술가라 부르지.
작품 '참 좋은 인생' 앞에 오래오래 서있었다. '선량한 사람들' 앞에도. 작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좋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매일 주변의 풍경을 살피고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참 좋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선량한 사람이 되어갔답니다.'
미셸 들라크루아의 전시를 본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은 따뜻해졌고 조금 더 다정해졌다. 무릇 좋은 인연은 간직되는 것. 한겨울 오렌지빛 난로같은 전시를 만나러 다시 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