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걸려 찾는 신약 물질, AI는 7년 만에 뚝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디지털 휴이넘이 온다
폐섬유증 치료물질 검증 돌입
개발 비용도 10분의 1로 감소
폐섬유증 치료물질 검증 돌입
개발 비용도 10분의 1로 감소
의약은 인공지능(AI)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다. 신약 하나를 내놓기 위해 제약회사가 후보군에 올리는 합성화학물은 약 1만 개. 신약 개발 성공률로 따지면 0.01%다. 세포·동물 실험 단계인 전임상을 거쳐 임상 1~3상을 마치는 데 15년가량이 걸린다. 업계에선 AI가 처음부터 최적의 약물 후보를 찾아낸다면 이 기간을 7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AI가 찾아낸 물질이 약효를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홍콩 인실리코메디슨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만든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로 작년 6월 중국·미국 임상 2상에 착수했다. 이 후보물질의 설계와 발굴은 모두 AI가 맡았다. 이를 통해 인실리코메디슨은 4~5년이 걸린 약물 발굴 기간을 18개월로, 개발 비용은 10분의 1로 줄였다.
빅파머(대형 제약사)도 앞다퉈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일라이릴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AI 기반 유전체·단백질 분석업체인 파우나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앱시와 2억4700만달러(약 3110억원) 규모의 신약 개발 계약을 맺었다.
AI 업체들도 신약 개발 사업에 발을 들인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스위스 노바티스와 함께 AI혁신연구소를 세우고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지난해 7월 AI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인 미국 리커전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이미 AI가 찾아낸 물질이 약효를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홍콩 인실리코메디슨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만든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로 작년 6월 중국·미국 임상 2상에 착수했다. 이 후보물질의 설계와 발굴은 모두 AI가 맡았다. 이를 통해 인실리코메디슨은 4~5년이 걸린 약물 발굴 기간을 18개월로, 개발 비용은 10분의 1로 줄였다.
빅파머(대형 제약사)도 앞다퉈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일라이릴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AI 기반 유전체·단백질 분석업체인 파우나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앱시와 2억4700만달러(약 3110억원) 규모의 신약 개발 계약을 맺었다.
AI 업체들도 신약 개발 사업에 발을 들인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스위스 노바티스와 함께 AI혁신연구소를 세우고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지난해 7월 AI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인 미국 리커전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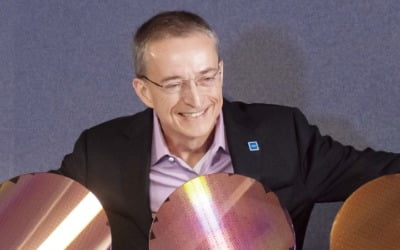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