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출세도 했죠. 행운의 실체는 사회가 내밀어 준 따뜻한 손길” [인터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펴낸 김선민 전 심평원장
선천성 담관낭종·대장암 등 이겨내고 의료 정책가로 활약
자기 삶 솔직하게 기록한 책…힘든 이들에 응원 메시지 보내
선천성 담관낭종·대장암 등 이겨내고 의료 정책가로 활약
자기 삶 솔직하게 기록한 책…힘든 이들에 응원 메시지 보내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60)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장암 3기에서 생존했고, 의약분업에 찬성하며 전국의 의사들을 적으로 돌려세우고도 병원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심평원 수장을 맡았다. 그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신간 에세이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는 자기의 삶을 담담히 돌아본 책이다. 다사다난했던 삶을 솔직하게 기록한 이유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응원가가 될 수 있을까해서 였다.
“운이 좋았다”던 김 전 원장은 행운을 실체를 찬찬히 뜯어봤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자신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손을 잡게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받쳐준 것은 사회 발전의 다른 얼굴이었죠. 연대의 손이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의학의 발전, 한국 사회의 발전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도와준 분들이 행운의 실체였어죠.”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출세도 했죠. 행운의 실체는 사회가 내밀어 준 따뜻한 손길”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56228.1.jpg)
“암에 걸렸다 살아나기까지,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네 외과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부모형제들이 나를 도울 수 없었다면, 다시 세상에 나와 직장을 잡을 수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행운이 겹치고 얽힌 덕분에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거죠.”
병은 그의 진로도 바꿨다. 아픈 몸으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임상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예방의학을 택했다. 가정의학과 산업의학 전문의도 추가로 땄다. 남들이 잘 가지 않던 그 길이 그를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왔다.
지방의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환자들과 달랐다. 흔한 질병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병인데도 시간이 없다며, 돈이 없다며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진료만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없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정책 연구자로 일하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 합류했다. 암 투병 후에는 2년의 공백을 딛고 심평원에 들어갔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 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 그룹’ 의장을 거쳐 2020년 심평원 첫 여성 원장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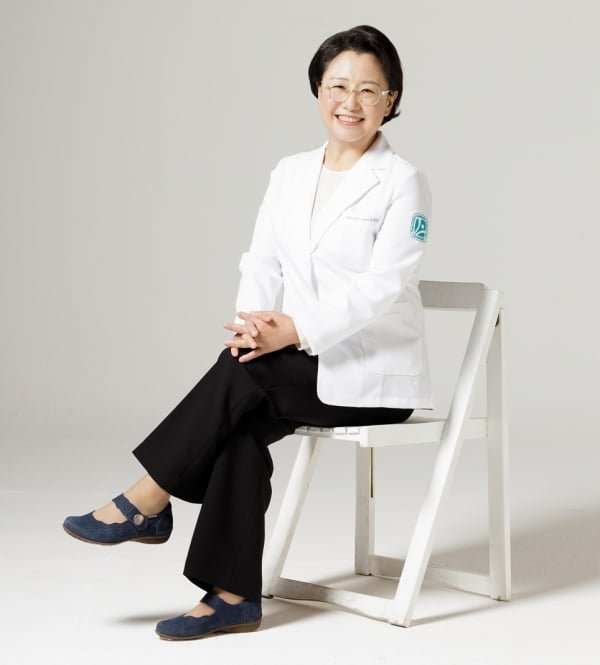
“부모님 영향이 컸어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올곧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집 좁아 못 살지 않는다. 마음 좁아 못 한다’라거나 ‘사람이랑 그릇은 두면 다 쓴다’ 같은 말들이요. 아버지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가 책을 쓰고 싶었던 20대 초반부터였다. 아플 때마다 뭔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에피소드만 있다고 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글을 통해, 책을 통해 무엇을 전할까 고민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그 고민의 결실이 이번 책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어려운 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그들도 저처럼 30~40년 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런 소통을 바라며 책을 썼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단순하고도 위대한 발명품 7가지, 우주선도 스프링없으면 못 난다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71979.3.jpg)

![나의 결정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면?..인식의 지배자 '알고리즘' [WSJ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6087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