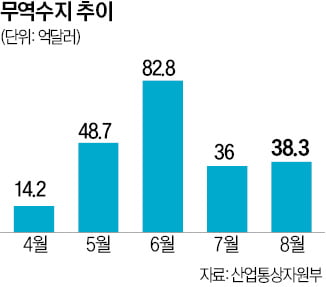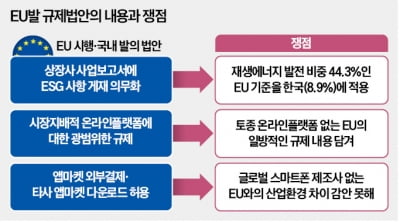[단독] 산업기술 유출 범죄 느는데 檢 전문 수사인력은 '태부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년 기소 82건 … 5년 새 2배로
중앙지검선 단 3명이 사건 전담
그나마도 보직 2년 … 수사 '구멍'
중앙지검선 단 3명이 사건 전담
그나마도 보직 2년 … 수사 '구멍'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기술 유출 기소 건수는 82건을 기록했다. 40건이던 2018년에 비해 5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검찰은 2017년에서 2022년 9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내 기술은 112건으로 전체 피해액을 26조931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이다. 기술 유출 사건은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어려워 지난해 기소된 82건 중 불구속 49건, 약식 처분은 18건이나 됐다.
검찰은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검사 정원이 국회법으로 규제받고 있어서다. 2014년 개정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해져 있다. 각 지청에서 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는 62명으로 전체 검사의 2.7%에 불과하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평검사는 3명에 불과하다.
검찰의 인사 규정이 전문 수사 인력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일반 검사의 보직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전문부서에 근무 중인 검사는 본인 희망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대 1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평검사들은 최대 2~3년이면 다른 청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탓에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했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기술 유출을 최고 36등급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188개월(15년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9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비용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형벌을 부과한다.
한국은 지난 19일에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최고 형량을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