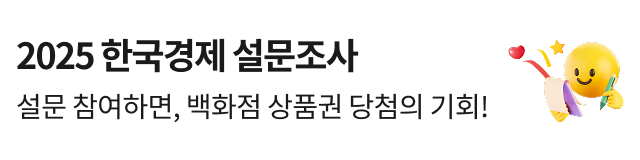"회기 남은 만큼 반드시 처리해야"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국가·지자체가 도와야

정 회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여론이 결코 야당(더불어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회장은 수산중공업과 수산인더스트리 등 9개 계열사를 경영하는 중견기업인이어서 이번 사안의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선배기업인으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직접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사장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전·생산·영업·회계를 막론하고 사장이 다한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을 불려다니게 되는데 심한 경우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장을 감옥에 넣으면 나머지 임직원에 안전은 누가 돌보나”라고 걱정했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계까지 이 법 시행으로 국내를 떠나게 될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정 회장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상을 석권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감옥을 갈 위기에 놓이면 어느 기업인이 국내에서 경영을 하고 싶겠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야말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옥죄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만약 2년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업들은 안전관리를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관리자를 국가가 채용해서 파견해주는 형태를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의 퇴직한 건설현장 유경험자들을 2~3주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주되, 2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파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국내에 훈련된 안전관리자가 충분하지 않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영세사업장일수록 인력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궁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 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전국민의 안전 의식이 높아진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도로교통법이 도로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가 명확하고 규정이 다르듯이 안전관리제도도 산업별·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이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 당시 졸속으로 처리돼 모순 투성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되, 경찰보다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려 조사 등 권한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