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반도체 만들지 말라는 거냐"…논쟁 벌어진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논란
재생에너지·원전론자 '갑론을박'
재생E 간헐성 치명적…조화 필요
재생에너지·원전론자 '갑론을박'
재생E 간헐성 치명적…조화 필요

반도체 공장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다. 삼성전자의 국내 전력 사용량은 18.41테라와트시(TWh)로 단연 1위였다. 2위 또한 SK하이닉스로 9.21TWh를 썼다. 철강사가 전기를 많이 쓴다지만 현대제철이 7.04TWh로 3위에 그쳤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반도체 공장)이 늘어날수록 전력공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떤 전기를 공급하느냐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100'(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이 '대세'가 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도 없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요구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RE100은 기업이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쿠폰처럼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더라도 RE100을 이행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채우는 중이다.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만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24/7 CFE' 캠페인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다. 해당 캠페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실시간 방식이 아니라 RE100과 유사한 '연간 정산'을 택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 100%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겨우 70MW 수준이다. 수요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대로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경기남부 일대는 태양광 패널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공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 녹색프리미엄 제도 등 시행을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리스크를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아예 직결시키라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라는 평가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일조량이나 풍량이 적어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말해 비오는 날엔 반도체 만들지 말라는 거냐"고 말했다.
정부가 RE100 대신 글로벌 무탄소에너지(CF) 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전력 다소비 업종이 근간인 우리나라 산업에는 싸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적어도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는 틀린 게 없다"며 "정부가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물론 탄소중립은 돌이킬 수 없는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조화롭게 함께 가야할 에너지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너지 정치화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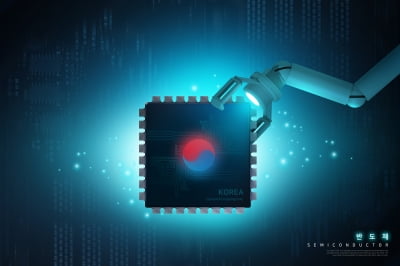
!["삼성은 애플 절대 못 이겨" 쏟아진 조롱…당신들이 틀렸다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2.3411766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