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찾아온 친구와 1층 커피숍서 노닥거려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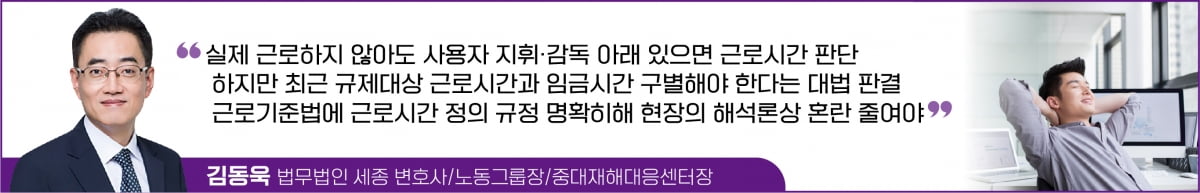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즉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법이 기준근로시간에 의하여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실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있다. 종래 판례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9. 선고 91다14406 판결),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92누9766)고 해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는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판례가 말하는 이러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일반적인 것이어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시간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게 된다. 행정해석은 판례보다 더 솔직하게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근로시간 판단에 실제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은 당연한 것을 규정한 확인적 규정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규제대상인 근로시간은 본질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 임금시간(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임금시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찾아온 친구를 만나기 위해 사용자의 허락 없이 20분 정도 자리를 이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회사들이 있다. 만약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례의 이석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근로시간의 본질과 임금시간과의 구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마침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해석론상 혼란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기 때문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