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 된 ‘컬러 포토그라피’…이태원 찾은 현대사진 거장의 필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카드 스토리지 미국 현대사진가 7인전
‘어반 크로니클스: 아메리칸 컬러 포토그래피’ 7월 28일까지
‘어반 크로니클스: 아메리칸 컬러 포토그래피’ 7월 28일까지
‘색(色)이 없는 사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사실 사진의 역사에서 색이 스며든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현실을 기록하는 매체’인 사진의 본질을 지키는 데 색은 불필요한 요소란 인식이 뿌리 깊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대사진가 워커 에반스는 1969년 “색은 사진을 타락시킨다”며 컬러 사진을 천박한 것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이런 사진예술 권력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사진가들은 무작정 거리로 나서 간판, 자동차, 상점, 사람 등 특별할 것 없는 대상을 찍고, 색감도 고스란히 살렸다.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저널리즘적 관점을 깨뜨리고, 흑백사진만이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존 사진예술 개념을 전복시킨 것이다. ‘뉴컬러 포토그래피’라 불리는 이 경향은 컬러사진이 예술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된다.

전시는 컬러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린 첫 사진작가로 기억되는 윌리엄 이글스턴(1939~1976)부터 조엘 마이어로위츠(1938~), 비비안 마이어(1926~2009), 사울 레이터(1923~2013), 스티븐 쇼어(1947)까지 현대사진 거장들의 작품으로 빈틈없이 채웠다. 최근 사진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사진가 다니엘 아놀드와 아나스타샤 사모일로바의 요즘 감성 듬뿍 담긴 작품까지 총 70여점이 걸렸다.

거장들의 작품 속에서 다니엘 아놀드의 작품도 존재감이 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유머러스한 모습을 촬영해 SNS로 소통하며 이름을 알린 아놀드는 뉴욕타임스가 ‘인스타그램의 이글스턴’이라고 극찬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로 무장하고선 뉴욕 거리에서 만난 인물들의 감정을 포착한 작품으로 벽면을 채웠다.

지하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섹션은 형형색색의 도시 풍경에 초점을 맞췄다. 주유소 등 1970년대 초 미국의 전형적인 일상을 촬영한 이글스턴과 쇼어의 사진은 물질주의가 고개를 든 가장 미국적인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전시는 한 마디로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하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감성과 맞닿아 있다. 사진이란 매체에 대한 깊은 탐구보단 가볍게 즐길 만한 전시란 뜻이다. 전시는 7월2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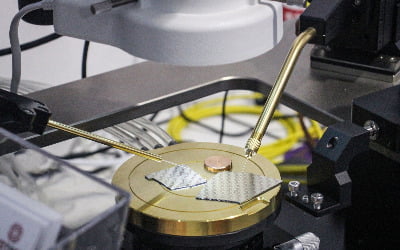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