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그만 나라에 넘쳐나는 아트페어, 과잉 시대의 생존법칙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서진석의 아트 앤 더 시티

최근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에 다녀왔다. 이제 곧 ‘아트 부산’과 ‘프리즈 서울’ 페어도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아트페어가 있을까? 인구 약 5000만인 나라에 현재, 어림잡아 10개 이상의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을까?
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공급과잉의 현상을 낳았다.
“Too many construction company, Too many automobile company”.
그리고 경제계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정리와 합병의 진통을 겪으면서 나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Too many art fair, Too many Biennale.”
세계 현대미술계도 미술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제적 문화행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된다. 전 세계에 비엔날레가 200여 개가 넘게 열리던 시절도 있었다.
10여 년 전 필자가 참석한 아시아 큐레이터들의 모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 그 내용은 ‘수없이 창궐하고 있는 아시아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중에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고 또한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에 수많은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생기면서 세계 미술계가 급성장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출현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만 빼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들은 어떠한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한정된 내수시장으로 인해 국내 화랑과 소장가들만을 위한 소수의 로컬 아트페어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아트페어들이 다루지 않는 차별화된 예술 상품과 시장을 개척하여 세계 미술계에서 또 다른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의 세계 미술시장에서 ‘바젤’과 ‘프리즈’ 등 글로벌 아트페어를 상대로 경쟁하며 동등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앞으로 미술시장에 나름의 조정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일 것 같다.

20세기 현대미술계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서로 공생의 관계를 구축하며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정부주도의 국제 문화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열리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동시대의 우리는 이 두 거대 권력이 만들어놓은 파이 안에서 그저 나눠먹기식의 경쟁은 이제 그 의미가 없음을 자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과거 유미주의와 상업주의 예술계가 만들어놓은 문화 생태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국제 예술행사를 모색하고 제안하여, 우리 스스로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동시대는 우리가 세계 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틈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관련 리뷰] '비엔날레의 계절'이라지만...너무 많은 거 아냐?
▶▶▶[관련 뉴스] 韓, 허울 좋은 '비엔날레 최다 보유국'…뜯어보면 '지역축제' 수준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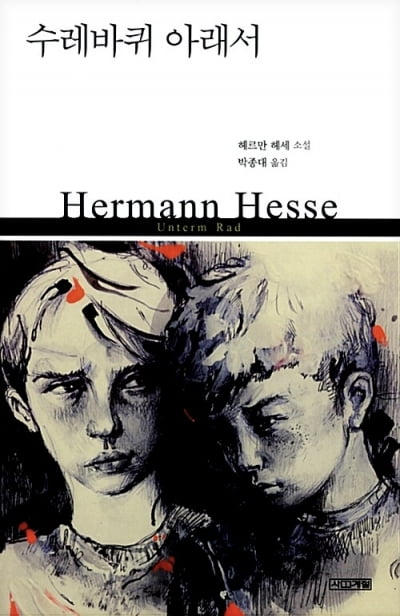
![[칼럼] ‘ESG 기본법’ 제정하는 ‘ESG 국회’를 바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57147.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