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필 이끈 정명훈, 대가의 관록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합창 교향곡' 공연
베토벤 삼중 협주곡에선 직접 피아노 연주
베토벤 삼중 협주곡에선 직접 피아노 연주

정명훈은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쿄필)와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01년 이래 이 오케스트라의 특별 예술고문으로 있으며, 2016년에는 명예음악감독 직위가 추가되었다. 서울시향을 떠난 직후에 이런 영예를 얻게 되어 지휘자 입장에서도 느낌이 남달랐을 것이다. 이런 귀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정명훈과 도쿄필의 내한공연은 생각보다 무척 드물어서, 양자가 정식 단독 투어로 서울을 찾아온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의 일인 만큼,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한 무대일까 궁금해하며 공연을 참관했다.


전반 악장은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지나치게 느리지 않으면서 카타빌레적인 느낌과 생동감을 잘 살려낸 3악장은 훌륭했고, 4악장에서 기악만으로 진행되는 전반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듯하다. 4악장 후반부는 좀 복잡한 인상을 주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노래한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은 전반적으로는 경륜에 맞는 무게감을 보여주었으나 ‘환희여!’[Freunde]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들뜨고 높은 소리로 어색함을 느끼게 했다.
테너 박승주는 일관되게 정석적인 가창을 들려주었고, 소프라노 황수미 역시 무척 낭랑하게 노래했는데 바로 옆에 선 메조소프라노 김정미와 균형이 잘 맞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이 곡의 성악 밸런스 자체가 메조소프라노에게 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황진규 음악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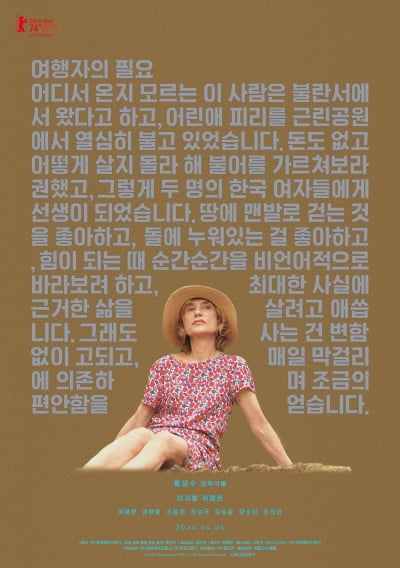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