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의 시녀' 취급 받던 사진, 프랑스는 이렇게 키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곡미술관 ‘프랑스현대사진’ 기획전
프랑스 사진가 22명의 작품 86점 선봬
생성AI, 회화 기법 활용 등 사진의 지평 넓혀
프랑스 사진가 22명의 작품 86점 선봬
생성AI, 회화 기법 활용 등 사진의 지평 넓혀

비록 프랑스 낭만주의 거장 보들레르가 “사진은 과학과 예술의 시녀”라 격하하고,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모델 대신 값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며 예술의 보조도구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사진은 20세기를 거치며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과거 사진이 세상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오늘날 사진은 세계와 카메라 사이 존재하는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프랑스 사진가 수잔 라퐁의 말처럼 고전사진에서 현대사진을 넘어온 1970년대부터 카메라가 ‘개념을 시각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사진이 태동한 프랑스에서 수확한 현대사진
한국 미술애호가들에게 사진이 회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각예술 매체로 소개된 것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미술관과 이름난 갤러리들이 사진전을 열기 시작했는데, 대다수가 독일이나 미국 중심의 현대사진전이었다. 작품들도 고전적인 스트레이트 사진이 많았다. 사진의 본질적 목표인 재현(再現)을 뛰어넘는 표현매체의 가능성과 실험적 성취를 보여주기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신문로2가 성곡미술관에서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프랑스현대사진(French Photography Today: A New Vision of Reality)’ 전시가 반가운 이유다.프랑스현대사진전은 19세기 중반 사진을 발명한 프랑스에서 발전한 오늘날 사진예술의 수준을 가늠하는 전시다. 인공지능(AI) 등 과학의 발달로 카메라가 구닥다리 기술이 된 지금, 사진이 오히려 단순히 시간을 담는 그릇이 아닌 현실과 상상, 가상을 중첩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첨단 미술을 제시하고 있다는 맥락을 읽는 자리다. 최근 국내에서 다채로운 사진전이 열리고 있지만, 프랑스 현대 사진가의 작업이 생소했던 터라 신선하다. 이수균 성곡미술관 부관장은 “사진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매체라 최근 사진전 열풍이 부는 것도 납득이 간다”면서도 “정작 발명국인 프랑스 사진을 만날 기회는 없었단 점에서 이번 전시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AI부터 판화까지…“사진인 듯 아닌 듯”
전시에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22명의 작가 작품 86점을 모았다. 촉망받는 20대 사진가부터 프랑스 사진계를 주름 잡아 온 80대 원로 작가까지 다양하다. 프린트의 경우 출력 방식과 종이 다양성을 고려해 절반 이상을 파리 현지에서 직접 출력해 보내고, 에디션 없는 빈티지 프린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등 작가들도 이번 전시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브로드벡과 드 바르뷔아 커플의 작품 ‘평행의 역사’ 연작은 생성AI 미드저니를 통 만들었다. 한 번에 눈물이 다섯 갈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기괴하다. 어느 시대, 누구의 작품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 묘사를 통해 AI가 재창작한 것으로 인간의 인지와 기억이 AI의 데이터 저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필 수 있어 재밌다. 레코테는 “AI가 사진, 예술에 어떤 기여를 하고 또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작품에 녹아 있다”고 말했다.

플로르의 작업 ‘외젠 D.의 정원’ 연작은 사진의 틀을 가졌지만, 판화에 가깝다. 작가가 파리 들라크루아 미술관 정원에서 채집한 식물 사진을 동판에 새긴 뒤 잉크에 묻혀 찍어내는 ‘포토그라뷔르’ 작업으로 완성했다. 에릭 푸아트뱅의 ‘무제’는 꽃을 따왔단 점에서 플로르 작업과 비슷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실제 식물 크기와 똑같이 찍은 보다 사진에 가까운 작업이다. 마치 사진이 아닌 정물화 같은 엄격함이 느껴지고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19세기 암실 작업을 재해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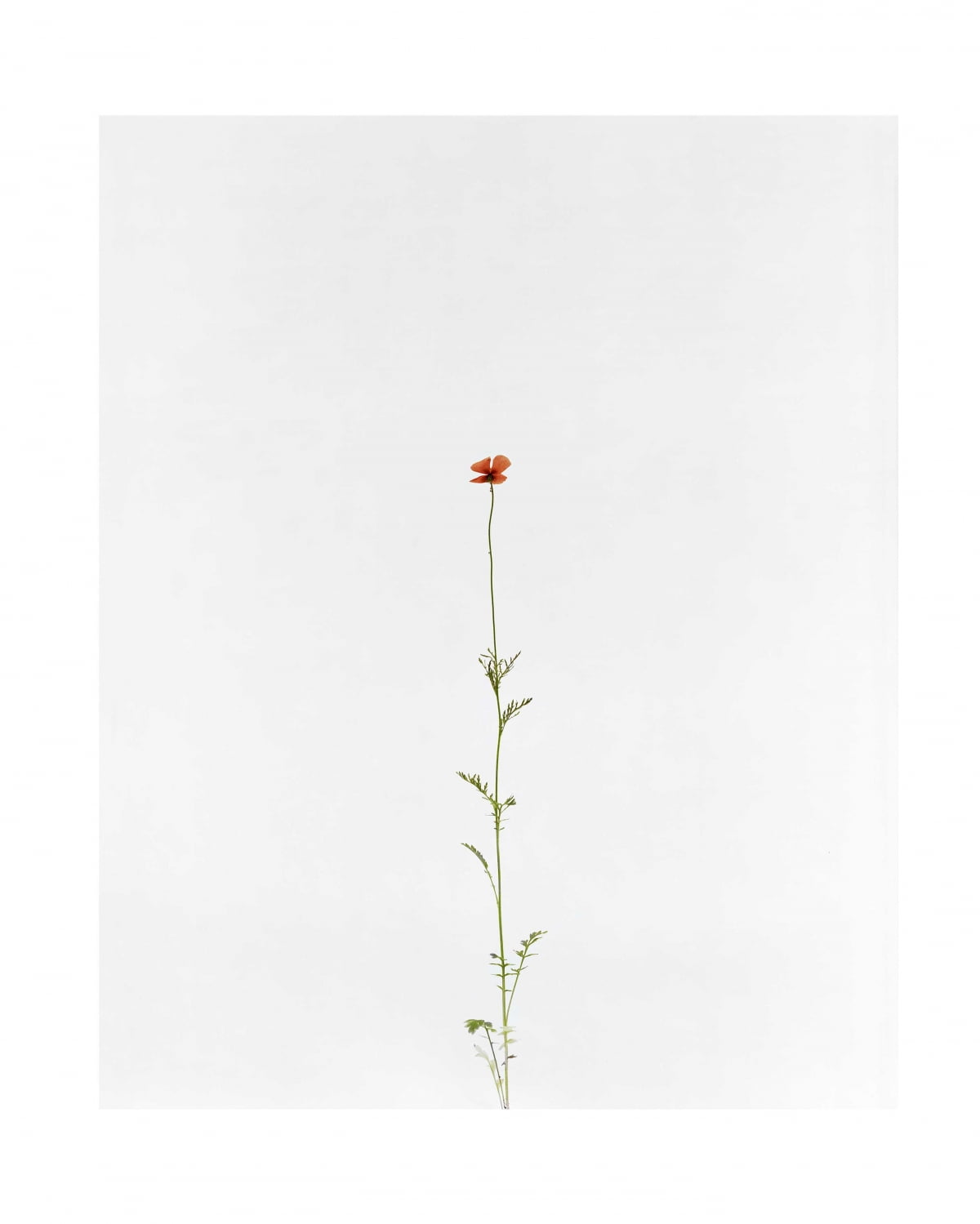
유승목 기자

![인류는 왜 의례에 집착하는가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68558.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