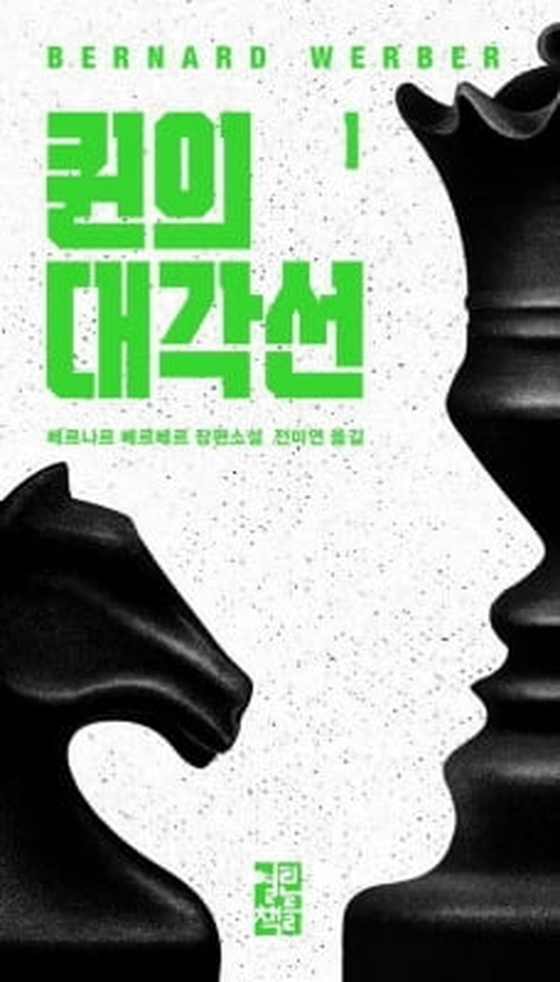대법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전 판례와 비교하면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가해자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을 내놨다.
A씨는 2016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천650만원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택시조합을 상대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1∼3심 모두 가해자 측인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 특히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6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2심에서 사고로 발생한 총손해액은 약 10억원, 사고의 책임 비율은 A씨가 40%, 택시 기사가 60%로 정리됐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쟁점은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2천65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계산법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손해액'(약 10억원) 중 '가해자 부담금'(약 6억원)에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장애연금'(2천650만원)을 뺀 만큼을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다.
공제한 2천650만원은 공단에 돌아간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총손해액'(약 10억원)에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장애연금'(2천6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 중 60%를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천650만원 중 60%인 1천590만원만 가져갈 수 있다.
공단이 이미 피해자에게 2천650만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할 때 공단식 계산법을 따르면 공단은 지급한 만큼 회수하는 것이 되지만 2심 계산법으로는 공단이 1천6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다만 그만큼 피해자는 추가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 과실 몫의 장애연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2심 계산법을 택했다.
대법원은 "손해가 제3자(택시)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A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적어도 '연금 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권을 대신 행사) 범위는 연금 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이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