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3% 불과…선진국 수준 40%까지 확 높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DI, 부동산PF 개선 보고서
'저자본·고보증' 구조 부실 위험
대손충당금 등 '간접규제' 필요
'저자본·고보증' 구조 부실 위험
대손충당금 등 '간접규제'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낮은 자기자본에 높은 보증 의존도 구조로 ‘한탕주의’ 행태가 나타나고 영세한 시행사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 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사들은 통상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2023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다. 하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 비율은 33%였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은 30∼40% 수준이었다.
한국에선 시행사로부터 공사 계약을 수주한 건설회사가 PF 대출 상황을 보증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은데도 대출이 이뤄진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로 이어지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 때문에 ‘묻지 마 투자’가 벌어져 사업성 평가가 부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 확충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쌓도록 하고 있다. 주택 공급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주거용으로 넓혀가자는 게 황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 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사들은 통상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2023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다. 하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 비율은 33%였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은 30∼40% 수준이었다.
한국에선 시행사로부터 공사 계약을 수주한 건설회사가 PF 대출 상황을 보증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은데도 대출이 이뤄진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로 이어지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 때문에 ‘묻지 마 투자’가 벌어져 사업성 평가가 부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 확충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쌓도록 하고 있다. 주택 공급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주거용으로 넓혀가자는 게 황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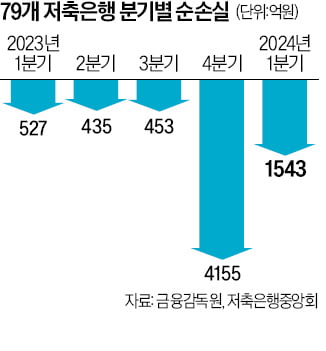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