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심각한 맞춤법…"적금 '혜지' 해달라는 손님 널렸어요" [이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기초 학력 미달' 4년 새 2배
교육부 "문해력 저하에 교사들 어려움"
국어 '기초 학력 미달' 4년 새 2배
교육부 "문해력 저하에 교사들 어려움"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0대 교사 권모 씨는 "제자들의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체감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맞춤법, 어휘력 수준부터 단어 뜻을 추론하는 능력 등의 문해력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학년 제자의 일기장을 보면, '되', '돼'는 물론이고 이제는 '행보캣다(행복했다)', '메순간(매순간)'같은 쉬운 단어도 틀린다"며 "검사할 때마다 해석하기 바쁘다"고 전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0) 씨도 "온라인에서 '조짐(兆朕)'이라는 단어를 보고 '누굴 조진다는 건가요'라고 반문한 학생의 사례를 보고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수업 중 엉뚱한 단어 뜻을 묻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 목도리를 '목돌이'로 쓴 친구도 봤다"고 전했다.
비단 교육 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원 김모(29) 씨는 "최근 군 적금을 해지하러 오는 20대 초반 고객 중 전표에 '전액 해지'를 '전액 혜지', '전액 해제'로 쓰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전표를 다시 써야 해서 젊은 손님이 오실 때마다 큰소리로 또박또박 '전액 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버릇이 됐다"고 털어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에서 '보통 학력' 이상 등급을 받은 고2 비율은 2017년 75.1%에서 지난해 52.1%까지 떨어졌다. 이제 절반은 보통 학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중3 비율도 2017년까지 84.9%였다가 2021년 74.4% 등 매년 떨어지더니 지난해 61.2%까지 낮아졌다.
국어 기초 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고2 학생의 비중은 2017년 5%에서 지난해 8.6%로 늘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이며 5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3의 미달 비율도 2017년 2.6%에서 지난해 9.1%로 3배가량 늘었다.
일각에서는 떨어진 국어 실력이 전반적인 학업 성취 능력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소위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라 불리는 수학 기초 학력 미달 고2 학생 비율이 작년 16.6%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다. 중2 수학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지난해 13%로 2017년 7.1%에 비해 늘었다.
자료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국어 문해력 저하로 교사들이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해력 약화가 타 과목의 실력 감소까지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처럼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문해력 향상'이 최신 교육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 대치동에서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박은주 씨는 "영어 조기 교육 열풍만큼이나 최근 초등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는 독서 교육과 논술학원을 필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국어를 못 하면 고학년이 되면서 영어, 수학 과목에서도 빈틈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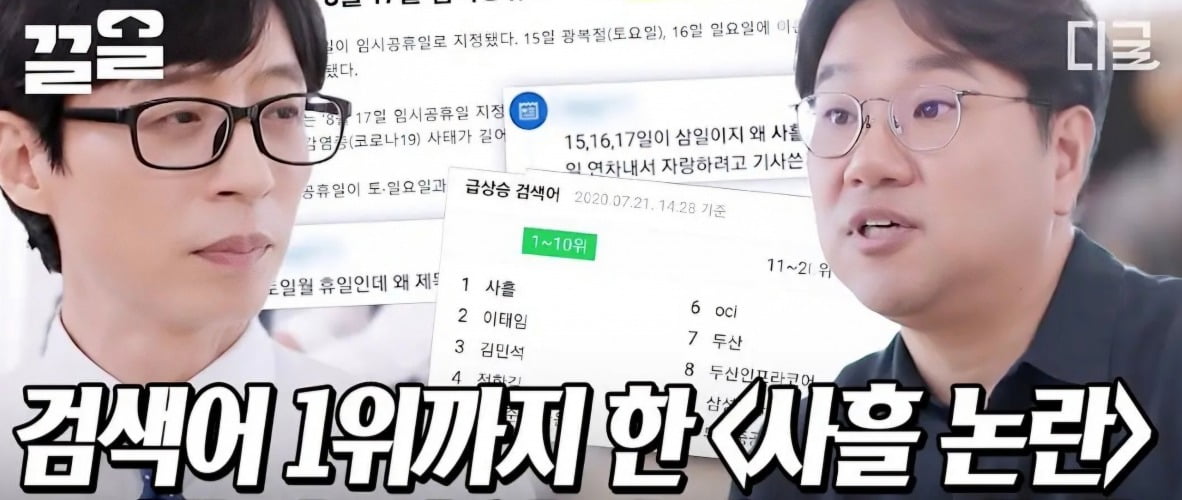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형광펜을 들고 책을 읽는 등 긴 글을 읽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2017년부터 매년 중3·고2 학생의 약 3%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적에 따라 기초 학력 미달(1수준), 부분 이해(2수준), 보통 학력(3수준), 거의 모두 이해(4수준)로 나뉜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정형돈도 "안타깝다" 탄식…4세도 캐리어 끌고 학원 간다 [대치동 이야기⑪]](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07149.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