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턱 막히는 아름다움이 뭔지 소리로 보여준 플레트뇨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월 27·28일 플레트뇨프 '라피협' 전곡 연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라흐마니노프 보여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라흐마니노프 보여줘

이렇게 느슨하고, 덜 뜨겁고, 조용하고, 무심하게 연주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 플레트뇨프의 라흐마니노프는 그렇게 다가왔다.
플레트뇨프의 ‘라흐마니노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도 열렸다. 말 그대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양일(6월 27일~28일)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플레트뇨프에게 가장 각별한 작곡가가 라흐마니노프고, 또 만년의 플레트뇨프가 안착한 작곡가가 라흐마니노프기 때문에 이번 무대는 연주자에게나 관객들에게나 모두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 플레트뇨프가 생각하는 라흐마니노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작품이 시작되고 관객들 모두가 금방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인데도, 그 어떤 것도 기존과 같지 않았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도입부부터 예상을 벗어났다. 지휘자와 사인을 주고받기 전에 플레트뇨프는 벌써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했다.

연주 내내 강조되는 음들도 달랐다. 때로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성부들을 엇갈려서 연주해, 새로운 질감을 빚어내기도 했다. 플레트뇨프가 지난 쇼팽 리사이틀 당시에도 자주 보여줬던 방식이었다. 미묘하게 음들을 엇갈리게 연주하니, 굳이 베이스를 세게 연주하지 않아도 효과적이었다. 또 이번에도 큰 소리를 사용해서 연주하지 않았다. 플레트뇨프는 만년에 이르러 포르테를 완전히 버렸다. 큰 소리가 필요하면 그저 툭 쳐서 효과를 낼 뿐이다.
그러다보니 플레트뇨프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는 방식은 모든게 낯설고 새로웠다. 확실한 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이런 방식이 가장 잘 구현된 작품은 첫째 날 연주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였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라흐마니노프가 탄생했다. 그 유명한 18번째 변주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소리로 보여줬다. 그밖에도 12번째 변주의 마법 같은 순간과 14번째 변주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재즈 음악은 양일간 있었던 순간 중 가장 기억난다.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소리로 구체화된 순간이었다.

그밖에 청년시기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1번에도 플레트뇨프만의 영감이 깃들어 있었다. 청년 라흐마니노프가 이 음악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상상하고 재현했다.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지만, 이 음악에서 그의 미래의 피아노 협주곡들이 들렸다. 플레트뇨프는 피아노 협주곡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며, 이 작품 또한 여전히 라흐마니노프의 뛰어난 작품임을 역설했다. 덕분에 작품의 가치는 더욱 격상되었다.

개성이 강한 연주와 함께 하다 보니 오케스트라는 당연히 여러모로 고전 할 수밖에 없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과 3번 마지막 악장에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서로에게서 크게 벗어나기도 했다. 그나마도 작년 ‘라흐마니노프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지휘자 타카세키 켄이 아니었더라면,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는 앙상블을 이루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타카세키 켄은 플레트뇨프의 음악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템포와 볼륨을 조절했고, 또 플레트뇨프의 다음 음악을 예측해서 울림의 지속시간을 조절하기도 했다. 덕분에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와 피아노 협주곡 4번에선 플레트뇨프만의 색깔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플레트뇨프가 혼자서 연주하는 음악들에 있었다. 결국 오케스트라는 그의 열손가락처럼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음악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앙코르 때엔 마법 같은 음악이 흘렀다. 첫날 앙코르인 차이콥스키 녹턴 op.19 no.4에선 여린 소리의 음악이 주는 울림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음은 어떤 강도를 누르는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리면서도 절묘했다.
두 번째 날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op.23 no.4에서도 감탄만 나왔다. 모든 성부가 아름답게 아른거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라흐마니노프 음악만이 줄 수 있는 정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모든 게 가능하면서도 편안했다. 잔향이 모두 사라지고, 불이 켜지고 나서야 플레트뇨프가 2시간 동안 만들었던 세계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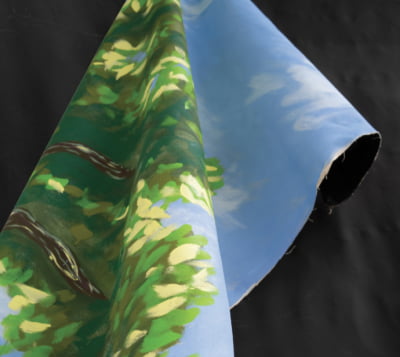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