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뮤지컬의 신화'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수작, <어쩌면 해피엔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사랑과 이별의 필연을 그려
세련된 스토리와 섬세한 음악 어우러진 수작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에서 9월 80일까지
사랑과 이별의 필연을 그려
세련된 스토리와 섬세한 음악 어우러진 수작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에서 9월 80일까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두 주인공은 사랑의 필연을 배운다.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 이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됐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고장 난다'. 누구도 가르친 적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풋풋한 첫사랑을 기다리는 건 필연적인 이별. 이미 고물이 된 두 로봇에게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클레어의 관절이 하나둘씩 삐그덕대고 고장 나면서 두 연인은 이별을 직감한다. 올리버와 클레오 둘 다 자신들이 작동할 날이 며칠 남아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 이별의 운명이 엄습하자 두 주인공은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한다.
주인공은 로봇이지만 인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죽음이 됐든 이별이 됐든 언젠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랑.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럼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랑이다.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이 애틋함을 더한다. 박천휴·윌 애런슨 듀오가 만든 멜로디가 두 주인공의 설렘과 긴장을 풋풋하면서 애처롭게 그린다. 작은 무대지만 깔끔한 연출과 소소한 유머 포인트 덕분에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심심하지 않다.
'창작 뮤지컬의 신화'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수작. 섬세한 감정 묘사에서 창의성과 울림을 주는 능력이 돋보인다. 극의 막바지에 이르면 객석은 코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눈물을 훔치고 엉엉 우는 관객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아프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브로드웨이 진출을 앞두고 있다. 뉴욕에 위치한 벨라스코시어터에서 9월 프리뷰 공연을 거쳐 10월에 본공연을 열 예정이다. 세계 뮤지컬의 메카 브로드웨이에서의 활약에 기대할만하다. 공연은 9월 8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에서.
구교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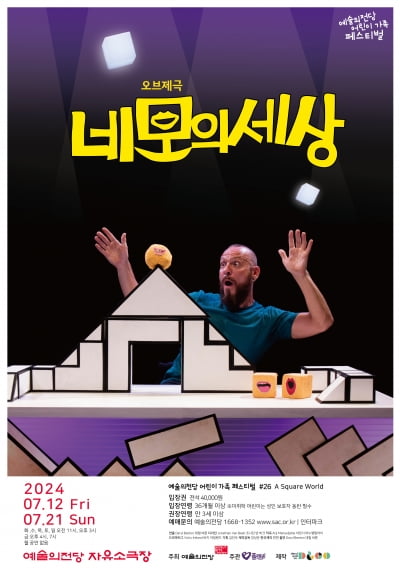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