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주류로 뜬 증권사…주식·부동산·세금 종합관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보다 해외주식 등 공격적 투자
국내 자산관리(WM) 분야의 양대 축은 은행과 증권사다. 크게 분류하면 은행은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증권사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주로 거래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산가들의 증권사 선호 현상이 짙어졌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젊은 부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있는 기존 자산가 또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은행보다 다양한 상품을 보유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를 찾는다는 전언이다.
실제 창업한 회사를 매각해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40대 창업가는 여러 은행과 증권사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해외 주식 거래로 이름난 한 증권사의 강남권 PB센터를 낙점했다. 자산을 더 불리려면 공격적인 해외 자산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해외 개별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추천받고 있다”며 “현금성 자산의 50%를 해외 주식으로 굴리고 있다”고 했다.
강준규 대신증권 WM추진부문장은 “은행은 원금보장 상품 비중이 크지만 증권사는 해외 ETF 등 트렌드를 빨리 따라잡는 상품이 많이 나온다”며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산가들이 증권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가 있는 기존 자산가들도 부동산, 세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필요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를 찾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과 거래하던 한 고액 자산가는 최근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30억원 이상이 최소 자산 조건인 한국투자증권 WM 서비스를 찾았다. 자녀가 졸업 후에도 정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세금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객과 PB의 ‘맨투맨’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세금 등 전문가로 팀을 꾸려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류은혁 기자 phs@hankyung.com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산가들의 증권사 선호 현상이 짙어졌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젊은 부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있는 기존 자산가 또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은행보다 다양한 상품을 보유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를 찾는다는 전언이다.
실제 창업한 회사를 매각해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40대 창업가는 여러 은행과 증권사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해외 주식 거래로 이름난 한 증권사의 강남권 PB센터를 낙점했다. 자산을 더 불리려면 공격적인 해외 자산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해외 개별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추천받고 있다”며 “현금성 자산의 50%를 해외 주식으로 굴리고 있다”고 했다.
강준규 대신증권 WM추진부문장은 “은행은 원금보장 상품 비중이 크지만 증권사는 해외 ETF 등 트렌드를 빨리 따라잡는 상품이 많이 나온다”며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산가들이 증권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가 있는 기존 자산가들도 부동산, 세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필요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를 찾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과 거래하던 한 고액 자산가는 최근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30억원 이상이 최소 자산 조건인 한국투자증권 WM 서비스를 찾았다. 자녀가 졸업 후에도 정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세금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객과 PB의 ‘맨투맨’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세금 등 전문가로 팀을 꾸려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류은혁 기자 ph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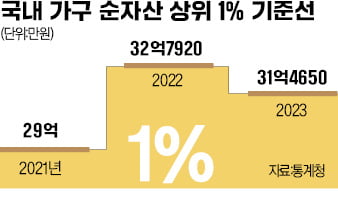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