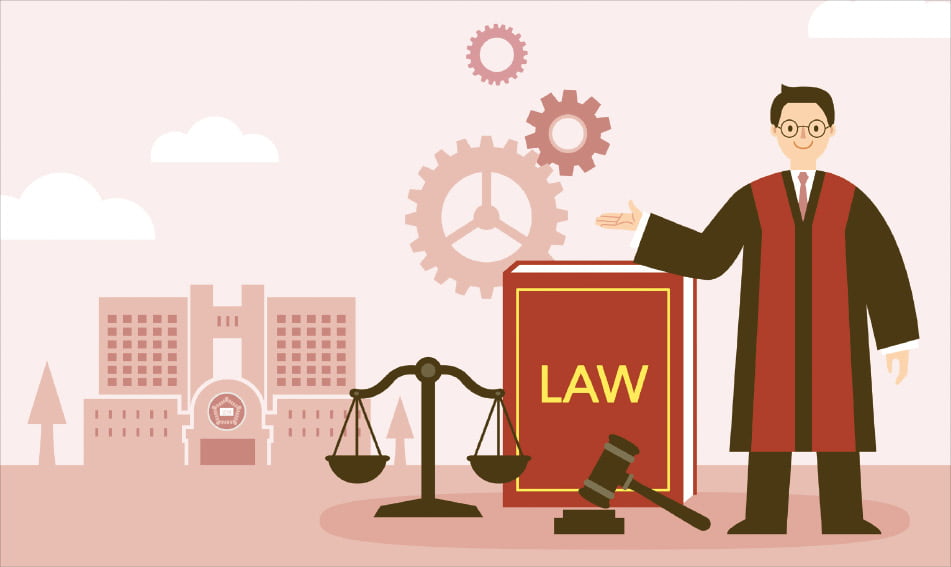
법률이 왜곡해온 우리말 ‘수두룩’
판결문에는 알 듯 말 듯 한 말이 하나 있다. ‘통정매매’가 그것이다. 법원의 이 메시지 구성으로 인해 언론이란 메신저를 타고 국민에게 전달된 판결문은 충분한 의미전달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실패’인 셈이다.국어사전에 ‘통정(通情)’이란 말이 나온다. 한자를 통해 보면 대략 ‘정을 통함’이란 뜻으로 짐작된다. 사전에서도 ‘남녀가 정을 통함’이란 뜻으로 풀이한다. “남의 남편과 통정하다”처럼 주로 부정적 상황에서 쓰인다. ‘간음, 내통, 사통, 야합’이 모두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게 우리가 ‘통정’을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의미다.
그런데 국어사전은 또 다른 풀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음’이다. “그는 나와 통정하는 유일한 친구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통정하고 지내온 사이다”처럼 쓴다. 여기에 ‘매매’가 붙으면 ‘증권 거래에서 상장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알려줘 주식을 사거나 팔게 하는 일’을 가리킨다. ‘통정어음’이라고 하면 ‘발행인과 수취인이 미리 짜고 거짓으로 꾸민 어음’을 말한다. 모두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일상의 말과는 거리가 멀다. ‘통정’ 하면 떠올리게 되는, 남녀가 정을 통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통정’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인데, 여기에 ‘매매’와 ‘어음’이 붙으면서 ‘미리 짜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 용법이 우리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가뜩이나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더 멀게 느껴지게 한다. 알쏭달쏭한 이 말이 우리 민법에도 나온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것이다.(김세중,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사전에도 없는 ‘조지’ ‘건정’ 버젓이
우리 민법은 왜 이렇게 우리말을 어렵게 해놓았을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곧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쉽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통정하다’는 1958년 민법 제정 때 일본의 민법 조문을 옮기면서 만들어낸 요상한 말이다. 그때 왜곡된 우리말 표현이 66년이 흐른 지금껏 고쳐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김세중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민법에는 이런 생뚱맞은 말들이 무수히 많다. 형법 제136조 제2항도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패 사례다. 여기에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때 ‘조지하거나’의 본말은 ‘조지하다’일 텐데,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다. 당연히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웬일인가? 이는 일본어 ‘阻止(そし, 소시)’를 우리 한자음 그대로 ‘조지’라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 말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우리는 그런 ‘조지’는 없고 ‘저지(沮止)’란 게 있다. 그러니 마땅히 ‘저지하거나’라고 하거나 ‘막거나’ 했으면 더욱 좋았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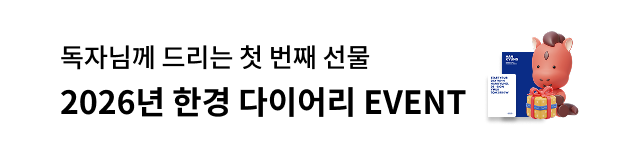
![[커버스토리] '중앙은행 무용론'…왜 나오는 걸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251256.3.jpg)
![[대학 생글이 통신] 방학을 공부 약점 보완의 기회로 삼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252094.3.jpg)
![[수학 두뇌를 키워라] 스도쿠 여행 (856)](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5557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