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 처방 받으려면"…17시간 비행기 타고 美 가는 환자들 [이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뇌전증 환자들이 한국약 처방 받으러
미국까지 가는 까닭
SK '엑스코프리' 美선 5년 전 시판허가
한국선 보험 약가 등으로 출시 일정 못 잡아
국내 의료진, 환자를 미국 병원으로 보내
미국까지 가는 까닭
SK '엑스코프리' 美선 5년 전 시판허가
한국선 보험 약가 등으로 출시 일정 못 잡아
국내 의료진, 환자를 미국 병원으로 보내

국산약 투약하러 美로 환자 보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뇌전증센터학회는 강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신경과 교수를 통해 뇌전증 환자의 미국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지에서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를 처방받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한국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병원을 찾아 강 교수 진료를 받으면 1년 치 약을 처방받게 된다. 강 교수는 병원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해 매달 한국으로 약을 보낼 계획이다.
다만 경련 발작 위험이 높은 환자가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야 하는 데다 초진비 235만원, 1년 약값 2400만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서 쓸 수 없는 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엑스코프리의 국내 판권은 동아에스티가 보유하고 있다.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2026년께나 국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SK는 미국 뇌전증 환자를 위해 무료로 약효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무료 공급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며 "약을 구경할수도 없는 한국 환자는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식 도입 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비급여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SK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비행시간이 4시간, 8시간으로 짧은 괌이나 하와이에서 진료 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찾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성 잘 생기는 뇌전증, 새 치료옵션 중요
엑스코프리는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시판 허가받고 이듬해 출시된 3세대 뇌전증 치료제다. 뇌전증 1세대 치료제인 페니토인 등 항경련제는 부작용 탓에 장기 복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3세대 치료제는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다.엑스코프리는 완전 발작소실율이 21%로 복용 환자 5명 중 1명에게서 발작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효과를 냈다. 3세대 치료제 중 국내에선 철수한 벨기에 UCB의 빔펫은 완전 발작소실율이 2.4~4.6% 정도로 알려졌다.
국내에 시판되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는 환인제약의 제비닉스, UCB의 브리비액트 등이 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이들과 비교한 연구를 통해 12주차에 엑스코프리 반응률이 20%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2022년엔 국제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에 기존 항경련제가 듣지 않는 성인 환자 13~16%에게 엑스코프리를 투여한 결과 발작이 사라지고 발작 빈도가 연간 최대 76%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기존 약제에 내성이 생겨 더이상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는 의미다.
뇌전증은 치료 차수가 늘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가 듣지 않는 불응성 환자는 30~40%에 이른다. 치료 옵션이 많을 수록 환자 치료엔 유리하다. 의료진들이 엑스코프리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낮은 약가에 한국패싱 잇따라
제약업계에선 엑스코프리의 국내 출시가 늦어진 이유로 '낮은 약가 구조'를 꼽고 있다. 국내 신약의 보험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혁신 신약에 높은 약가를 보장하지 않는 국내 건강보험 구조 탓에 한국 기업조차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신약 허가 장벽이 높은 것도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높은 규제장벽을 뚫고 국내 출시를 시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허가를 노리는 게 시장 확대 전략 차원에선 득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신약 약가는 값을 낮추려는 보험당국과 값을 높이려는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국가별로 다른 나라의 약가를 참고해 신약 가격을 정하는 데 특정 국가에서 약가를 낮게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낮은 약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 패싱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해 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당뇨약 포시가를 철수하기로 했다. 국내 연 매출은 500억원 정도다. 업계에선 지난해 4월 특허가 만료된 뒤 제네릭이 출시되자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 측이 사전 조치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2010년 허가 후 비급여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던 뇌전증약 빔펫이 2018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된 것도 마찬가지다. 제네릭인 SK케미칼의 빔스크 등이 잇따라 진입하자 약가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얀센도 2012년 변비약 레졸로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시장 진출엔 실패했다. 이후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2020년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을 시판 허가 받고도 국내 출시를 포기하면서 국내 제약사가 뒤따라 만든 제네릭이 시장에 먼저 진출하기도 했다. 비아트리스는 2007년 폐동맥 고혈압약 레바티오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약가 협상에 실패해 국내 출시는 하지 않았다. 이후 한미약품의 제네릭 파텐션이 먼저 시장에 진입해 판매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약가를 반영하는 중국의 의약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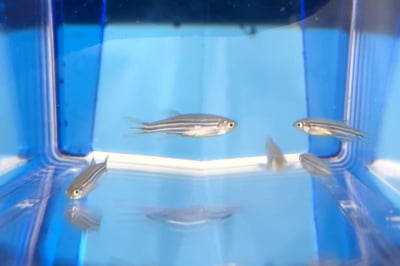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