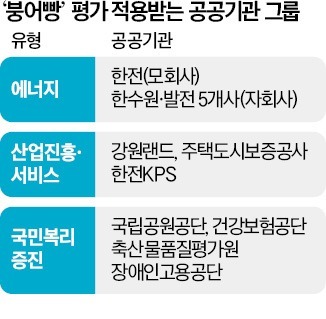韓·인니 추락, 말레이 급성장…'공운법'이 가른 석유公 경쟁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지나친 통제가 희비 갈라
印尼 석유매장량 5분의 1 토막
말레이시아는 50년새 50배↑
印尼 석유매장량 5분의 1 토막
말레이시아는 50년새 50배↑
한국석유공사와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엇갈린 희비는 공기업의 역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1970년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100억 배럴이던 인도네시아는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가 비효율과 부패로 파산하면서 2004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지위도 반납했다.
페르타미나를 망가뜨린 게 ‘인도네시아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재무부와 광업부, 국가개발기획청 장관 등 각료 중심의 정부감사위원회를 구성해 페르타미나를 통제했다. 한국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비슷한 기구다. 1976년 페르타미나가 파산한 뒤에도 정부 통제는 더 강화됐다.
같은 시기 매장량이 7억 배럴로 확인된 말레이시아는 2022년 매장량이 36억 배럴로 불어났다.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가 국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세계 8대 석유기업으로 성장한 덕분이다. 페트로나스가 낸 세금과 배당금이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의 40% 안팎을 차지해 ‘말레이시아의 삼성전자’로도 불린다. 정부의 100% 자회사지만 말레이시아 국가 신용등급(무디스 A3)보다 페트로나스의 신용등급(A1)이 두 단계 더 높다.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두되 총리의 경영 간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사회 멤버는 대부분 민간 출신이며 현역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페트로나스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는 국내 한 공기업 사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회사는 오직 매출과 이익에만 신경 쓴다고 강조해 놀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페르타미나와 흡사한 방식으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다보니 가격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되파는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석유공사가 보유한 해외 석유개발사업 자회사 13개 가운데 이익을 낸 곳은 5곳뿐이었다.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 다나페트롤리엄과 캐나다 하베스트오퍼레이션은 각각 1670억원과 748억원의 적자를 냈다. 임직원이 2만3320명인 석유공사의 지난해 순익은 1788억원이었다. 페트로나스(임직원 2만3320명)는 807억링깃(약 24조원)의 순익을 올렸다.
이슬기/정영효 기자 surugi@hankyung.com
1970년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100억 배럴이던 인도네시아는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가 비효율과 부패로 파산하면서 2004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지위도 반납했다.
페르타미나를 망가뜨린 게 ‘인도네시아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재무부와 광업부, 국가개발기획청 장관 등 각료 중심의 정부감사위원회를 구성해 페르타미나를 통제했다. 한국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비슷한 기구다. 1976년 페르타미나가 파산한 뒤에도 정부 통제는 더 강화됐다.
같은 시기 매장량이 7억 배럴로 확인된 말레이시아는 2022년 매장량이 36억 배럴로 불어났다.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가 국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세계 8대 석유기업으로 성장한 덕분이다. 페트로나스가 낸 세금과 배당금이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의 40% 안팎을 차지해 ‘말레이시아의 삼성전자’로도 불린다. 정부의 100% 자회사지만 말레이시아 국가 신용등급(무디스 A3)보다 페트로나스의 신용등급(A1)이 두 단계 더 높다.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두되 총리의 경영 간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사회 멤버는 대부분 민간 출신이며 현역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페트로나스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는 국내 한 공기업 사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회사는 오직 매출과 이익에만 신경 쓴다고 강조해 놀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페르타미나와 흡사한 방식으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다보니 가격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되파는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석유공사가 보유한 해외 석유개발사업 자회사 13개 가운데 이익을 낸 곳은 5곳뿐이었다.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 다나페트롤리엄과 캐나다 하베스트오퍼레이션은 각각 1670억원과 748억원의 적자를 냈다. 임직원이 2만3320명인 석유공사의 지난해 순익은 1788억원이었다. 페트로나스(임직원 2만3320명)는 807억링깃(약 24조원)의 순익을 올렸다.
이슬기/정영효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