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내부자거래 혐의만 있어도 '계좌 동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10년 주식거래 차단·신상공개도
10년 주식거래 차단·신상공개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주식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들이 상장사 임원이 되는 길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비롯한 3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은 지난해 28%에 달했다. 이들이 재판받는 와중에 불공정거래를 반복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릴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도 한층 강화된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방안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국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제재 내용도 공개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주식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들이 상장사 임원이 되는 길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비롯한 3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은 지난해 28%에 달했다. 이들이 재판받는 와중에 불공정거래를 반복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릴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도 한층 강화된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방안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국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제재 내용도 공개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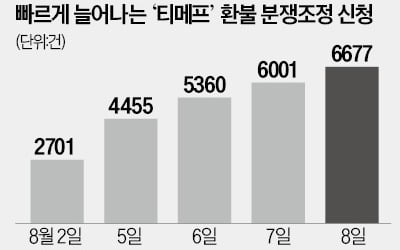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