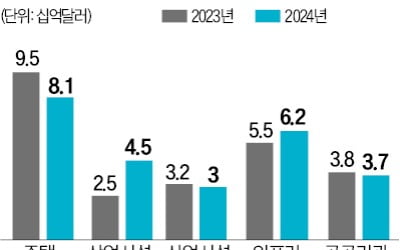창의적 디자인에 용적률 혜택…마리나베이 성공 이끈 '화이트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심복합개발이 도시 경쟁력
(3) 亞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규제 치외법권' 화이트존의 힘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간섭 최소
주거·호텔·오피스 복합개발 유도
'50년 대계' 바라보고 도시계획
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유지하자
MS·틱톡 등 기업 4200곳 몰려와
(3) 亞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규제 치외법권' 화이트존의 힘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간섭 최소
주거·호텔·오피스 복합개발 유도
'50년 대계' 바라보고 도시계획
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유지하자
MS·틱톡 등 기업 4200곳 몰려와

복합개발 유도하는 화이트존

정부는 전반적 청사진과 최소 주거 면적 비중 등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은 시장 수요를 잘 아는 민간(디벨로퍼)의 제안을 받아 ‘보텀업’(상향식)으로 결정한다. 화이트존이라고 해도 필지별로 용적률이 다르다. 다만 2000%가 넘는 용적률도 허용하는 등 일반 상업지역보다 규제가 약한 편이다.
녹지를 늘리거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싱가포르가 천편일률적 빌딩 숲에서 벗어난 이유다. 노후 항만 일대를 매립해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한 마리나베이가 대표 성공 사례다. 연구개발(R&D)과 바이오 등 지식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복합개발을 활용한다. 내털리 크레이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싱가포르 총괄대표는 “R&D 등이 중심인 ‘비즈니스파크 존’ 공간의 15%를 화이트존처럼 용도와 용적률 규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화이트존을 마천루(초고층 건물)를 유도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용적률을 결정할 때 단일 건물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변 건물과의 조화, 수요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며 “예컨대 R&D가 중심인 원노스 지역의 화이트존 부지는 중저층 위주로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예측 가능성 높은 도시계획

싱가포르 도시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에 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은 콘셉트플랜과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10년마다 수립하는 콘셉트플랜은 40~50년 뒤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이다. 창이공항과 마리나베이샌즈 등도 1971년 최초 콘셉트플랜 수립 당시부터 구상됐다. 마스터플랜은 5년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계획을 다듬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민간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어떤 콘셉트로 개발될지 예측할 수 있다.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오차드 지역 재건축, 마리나베이 2단계 개발 발주 등이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URA 홈페이지에는 지구별 용도와 개발 밀도, 용적률 등이 세세히 기재돼 있다. 디벨로퍼는 입찰에 나올 부지의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선거 결과가 바뀔 때마다 도시개발 구상이 뒤틀리는 국내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계획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이뤄진다. 물론 싱가포르는 토지의 90%가량을 국가가 소유해 효율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싱가포르에선 그림자 규제도 덜하다. 번화가인 탄종파가 건물의 고도제한 규제를 낮출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