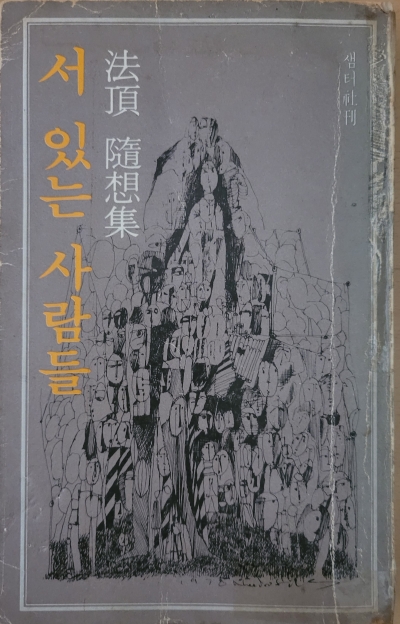구상의 스승이자 문학 도반인 공초 오상순 시인과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펄 벅에 얽힌 얘기다. 1960년 11월 초, 서울에 온 펄 벅은 명동 서라벌다방에서 철학적인 문답을 즐기던 공초에게 ‘사슴’ 담배 두 갑을 선물하며 한참 동안 선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날 감명을 받은 펄 벅은 공초가 펼친 사인북에다 이렇게 썼다. “It is better to light a single candle than to complain of the darkness(어둠을 불평하는 것보다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켜는 게 낫다).” 6·25전쟁 후 혼혈아동들을 돌보며 한국식 이름을 박진주(朴眞珠)로 지었던 펄 벅이 가장 좋아했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이 말은 중국 격언이나 공자의 말로 잘못 알려져 왔는데, 서구에서는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펄 벅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자주 인용한 말로도 유명하다.
구상 시인은 이 얘기를 전하며 “어느 사회나 모순과 부조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저 격언대로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한 촛불이라도 스스로 켜고 밝히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지닌 능력의 최선을 발휘해 보자”고 말했다.

그가 국제펜대회에 참가하러 일본에 갔다가 교토에 들렀을 때 일이다. 마침 추석이어서 동포들과 좌담회 겸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한 중년 신사가 “우리 민족은 한 사람씩 놓고 보면 다 우수한데 합쳐 놓으며 싸움질만 하고 큰 일을 못하니 어인 민족 특성이며 결함은 어디 있는지 문인으로서 솔직한 소견을 말해 달라”고 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다. “얼마 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인 크리슈나 메논이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장군은 이튿날부터 일본인의 숭앙을 받았고 한국에 진주한 하지 중장은 그날부터 시비(是非)의 초점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아 한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민주주의적인 국민이요, 한국의 민주주의 토대는 일본보다 앞섰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국민은 시비에 밝은 국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비 정신의 발동이 소의(小義)와 소아(小我)와 소리(小利)에 너무 치우쳐 대의(大義), 대아(大我), 대리(大利)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의(大義)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에 비해 소의(小義)는 사사로움을 앞세운다.
대아(大我)는 ‘참된 나’, 소아(小我)는 ‘자기중심적인 나’를 뜻한다.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려면 자기밖에 모르는 소아의 경계를 넘어 대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리(大利)는 그야말로 ‘큰 이익’이다. 대의를 위해 ‘작은 이익’을 버리면 손해 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를 거꾸로 하는 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니, 개인의 삶이나 정치·외교에서도 대리(大利)를 망각하고 소리(小利)에 집착하면 대패(大敗)하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 탓 공방에 죽기 살기로 싸운다. 왜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사회가 됐을까.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백년간 지속된 주자학적 명분 다툼이 가장 큰 듯하다. 이것이 이분법적 흑백논리와 내 편 아니면 네 편 식의 편 가르기, 좌우 이념의 진영논리까지 번졌으니 마치 소국(小局) 속에서 대국(大局)을 그르치는 것과 같다.
구상은 그래서 “우리의 예리한 양심은 항상 남을 저울질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특성을 살리는 길은 소의와 소아, 소리를 대의와 대아, 대리에 맞게 키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의 조급성과 감정 편중을 걱정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기자로 일하던 그가 결핵으로 휴양하다 8·15를 맞았을 때 트럭을 타고 태극기를 흔들며 돌아다니다가 들판에서 본 두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하나는 깡마른 중국 사내가 제 나라 승전 소식도 못 들은 듯 밭에다 거름을 주는 광경이었고, 또 하나는 꽃무늬 몸뻬(일 바지) 차림의 일본 아낙이 제 나라 패망 소식도 모르는 듯 호미로 김을 매는 풍경이었다. 중국인으로서는 10년 항쟁의 승리자요, 일본인으로선 앞날이 캄캄한 패전 국민인데, 이들은 흥분의 도가니와 절망의 수렁에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장면을 보고 “아직 해방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온통 흥분에 들떠 있는 우리 국민과 자신의 몰골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충격적인 기억은 해가 갈수록 확대됐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성의 조급함이나 감정 편중이 저들과 대비되어 나타나고 그 장래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전후 중국의 야심과 일본의 부흥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 산동성 호인(胡人)과 일본 여인네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떠올라 지워지질 않는다”며 씁쓸해했다.
이런 조급증과 감정 편중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지적, “현대인이 경계해야 할 것은 ‘성급’”이라는 말과 통한다. 삶의 성취나 원대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무시하면서 성급히 거머쥐려고만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즘의 정치 대립이나 사회 갈등, 분규나 파업, 모리배들의 이권 싸움도 마찬가지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모든 걸 남 탓과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분노하기만 해서는 대의도, 대아도, 대리도 얻지 못한다. 60여 년 전의 <침언부어>를 펼쳐놓고 오늘 나의 말과 글, 소의와 대의, 어둠과 등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