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색화가? 나는 그림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사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종로구 리안갤러리
김택상 개인전 '타임 오딧세이'
김택상 개인전 '타임 오딧세이'

후기 단색화가의 대표주자로 불린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파에 앉은 김택상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줄곧 평온했던 모습이 달라졌다. 그는 스스로를 '단색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1세대 단색화가였던 윤형근, 박서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며 "치열하게 다른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강조했다.
김택상에게 미술이란 '농사'다. 작업을 할 때 환경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대신 모든 과정을 시간과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라곤 밭에 물을 주듯 작품을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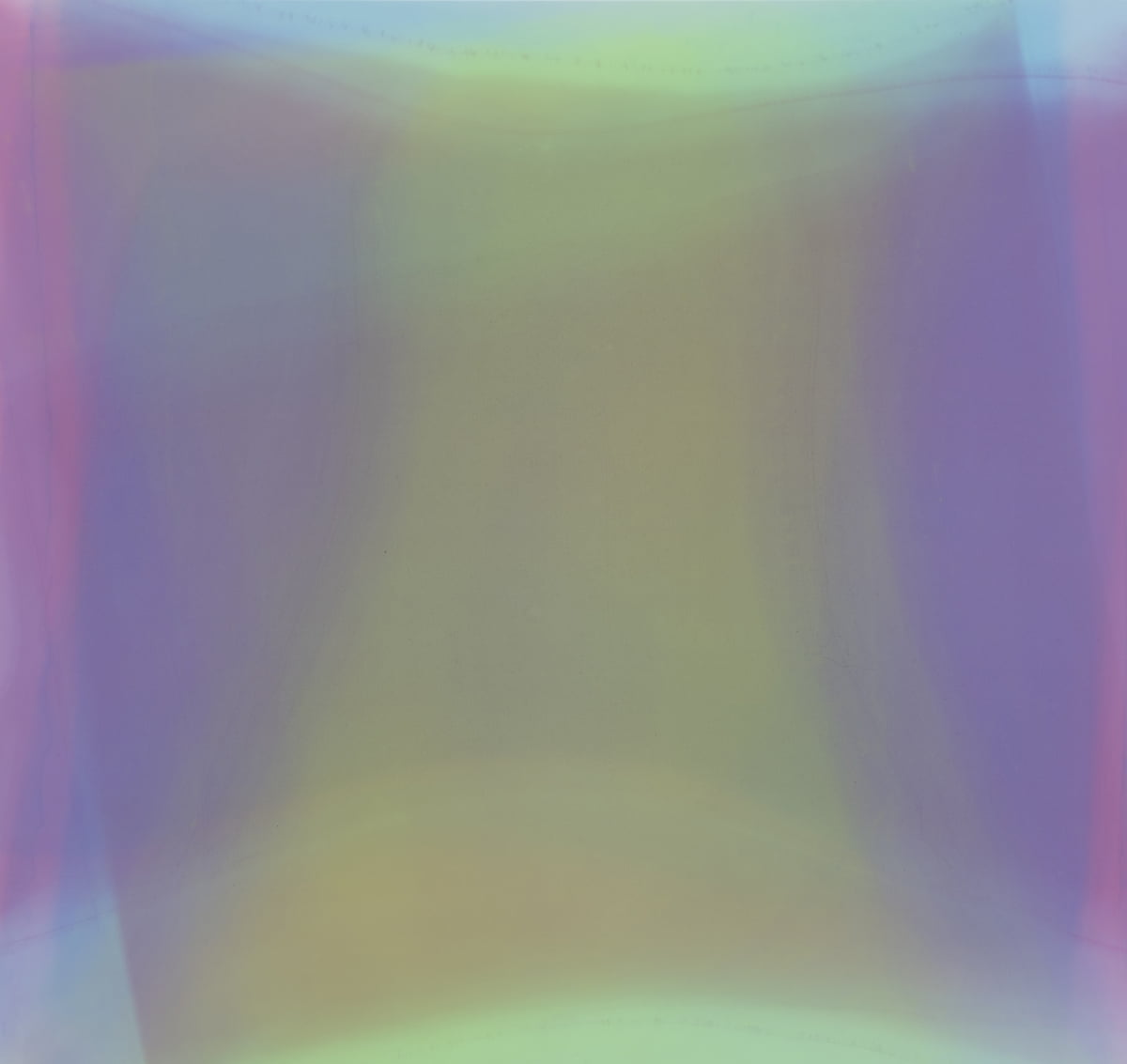
'기다림의 작가' 김택상이 자신의 신작들을 들고 관객을 찾아왔다. 서울 종로구 리안갤러리에서 여는 개인전 '타임 오딧세이'를 통해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플로우' 연작 등 관객에 처음 선보이는 작업들도 나왔다.
이번 전시의 특별한 점은 그가 지금까지의 전시와는 180도 다른 전시 환경을 택했다는 것이다. 자연광이 비추는 장소에 작품을 걸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인전에서는 지하에 '플로우' 시리즈를 들여놨다. 전시장의 불도 끈 채 오직 핀 조명과 액자 형태로 작품을 감싸는 프레임 조명에만 의존했다.

작품 제목도 행성 이름처럼 지었다. 그림을 완성한 후 바라보며 마치 새로 발견된 행성에 천문학자가 이름을 붙이듯 명명했다. 1층에 놓인 보라색의 대형 회화엔 '드래곤 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는 "그림이라는 행성에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며 천문학자의 꿈을 완벽하게 이뤘다"고 말하기도 했다.

캔버스도 직접 개발했다. 물감이 쌓이는 기존 캔버스 대신 물감과 수분이 안으로 스며드는 '수채화용 캔버스'를 만든 것이다. 섬유공예가와 함께 캔버스 개발에만 4년이라는 시간을 썼다. 수많은 실패 끝 지난해 폭 270cm가 넘는 대형 캔버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 개인전에서 개발한 캔버스를 쓴 작품들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10월 19일까지.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비틀스의 '가장 태평한 멤버' 링고 스타로 배우는 성공의 의미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44537.3.jpg)
![트럼프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드러나는 '한국의 길'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4432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