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어냄의 미학…추상으로 새로 태어난 달항아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화랑 최영욱 개인전, 신작 28점 전시
색·주둥이·형태 등 '3無'의 아름다움
색·주둥이·형태 등 '3無'의 아름다움

20년째 달항아리를 그려온 최영욱의 미술 인생도 이러한 덜어내기의 여정과 다름없다. 처음에 색을 비웠고, 그다음 백자의 '주둥이'를 걷어냈다. 최근에 이르러 달항아리의 형태마저 없애고 있다.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신작 28점을 선보인 그는 "그동안 항아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명암과 묘사를 더 했는데, 요즘은 군더더기를 빼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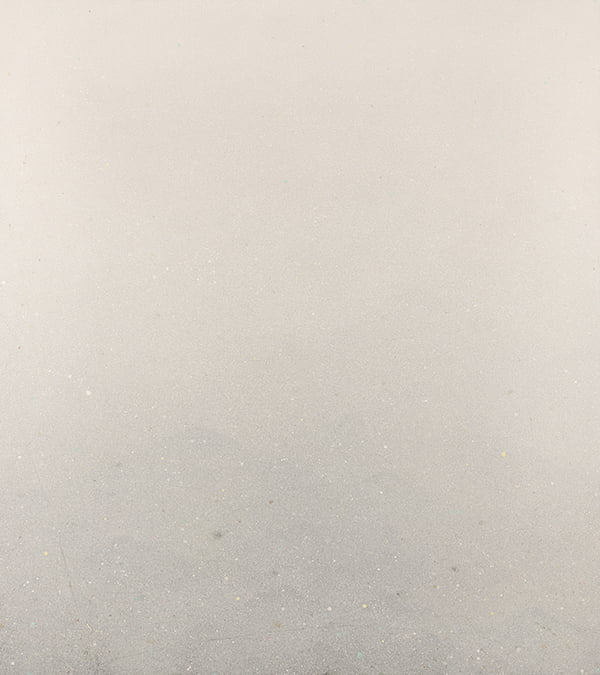
최 작가의 작업은 경기도 파주 작업실 인근의 자연을 산책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작가는 캔버스 위에 흰색 돌가루와 제소를 겹겹이 쌓는다. 표면을 사포질로 갈아내며 매끄러운 광을 내는 작업을 수십번 반복한다. 그 결과 화면에서 2~3㎜가량 볼록 튀어나온 그의 달항아리는 감초같은 입체감을 더한다.
그의 달항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천갈래의 빙렬(氷裂)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빙렬은 도자기 표면에 바른 유약이 식으면서 생긴 실금이다. 작가는 이를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인생사에 비유했다. 달항아리 시리즈의 제목은 동양 철학에서 업보(業報)를 의미하는 '카르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선택의 갈림길을 만났다. 한국관에 덩그러니 놓인 조선백자가 눈에 들어왔다. 쓸쓸한 느낌이 작가 자기 모습과도 비슷해 보였다고 한다. '국보급 유물' 정도의 고급 백자는 아니었지만, 고향을 떠나 우직하게 서 있는 자태에 반했다. 작가는 아무도 찾지 않던 한국관 전시장의 바닥에 눌러앉아 항아리를 관찰했다.
700점이 넘는 카르마 연작 중 달항아리 주둥이의 입구가 보이는 작품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박물관 바닥에서 백자를 올려다본 기억이 작가의 뇌리에 남았기 때문이다. "밑에서 올려다본 백자의 어깨선에서 당당한 기상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보자'란 다짐으로 달항아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몇몇 작품들은 작가의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달항아리 표면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흑백의 화면에 윤곽만 남긴 추상화들이 그렇다. 작가가 최근 1~2년 사이 골몰한 새로운 시도다. 달항아리의 변주를 분주하게 모색하는 만큼, 같은 소재를 20년째 다뤄도 지겨울 틈이 없다고 한다.
"초기작을 돌아보면 실제처럼 그리기 위해 치열하게 애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애착도 가지만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달항아리를 잘 그리는 것보다는, 항아리를 통해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시는 10월 21일까지.


![[단독] 간송이 물꼬 트고 이건희가 심은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 나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2897.3.jpg)
![아기는 선하게 태어나 혐오를 학습한다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1516.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